05. 무림의 평화가 위태롭다.

# 05. 무림의 평화가 위태롭다.
홍경이 머물던 토굴 근처의 계곡.
벌컥, 벌컥.
중년의 사내가 계곡물에 얼굴을 처박고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고 있었다.
“후우···. 이제 좀 살 것 같군.”
사내는 입가를 훔친 후 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내뱉었다.
“씨부럴. 섬서에서 사천까지 쫓아오다니. 무림 맹주씩이나 되는 놈이 그리 할 일이 없나?”
사내는 구화마존 석개두라는 인물로, 원래 섬서(陝西)에서 활동하는 무림인이었다.
가는 곳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아, 화근을 만든다는 뜻의 구화(構禍)라는 별호가 붙었다.
무공도 고강한 데, 경공은 천하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 지금껏 그리 사고를 치고 다녀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작은 문파 하나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그를 잡기 위해 벼르던 무림 맹주에게 걸려 사천까지 도망쳐 온 상황이었다.
세상에 적수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녔지만, 천하십존(天下十尊)에 이름을 올린 무림 맹주 불개세 만원갑의 상대가 될 순 없었다.
석개두는 청성산을 거쳐 북서쪽에 있는 사고랑산(四姑娘山)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곳은 장족(壯族)의 영역이라 외지인이 함부로 들쑤시고 다닐 수 없는 곳이어서 몸을 숨기기 적당했다.
여기서 사고랑산까지는 대략 200리 길.
열심히 달리면 한나절 안에 도착할 거리였다.
“후···. 한동안 쥐죽은 듯 숨어 살아야겠군.”
다시 얼굴을 처박고 물을 들이켜던 그때.
갑자기 첨벙첨벙,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란 석개두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피며 경계했다.
맹주가 벌써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살펴보니, 폭포 위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웃음을 터뜨리며 계곡물에 발을 텀벙거리는 모습이 철없는 아이 같았다.
석개두는 크게 살심이 돋았다.
이 몸이 저딴 놈에게 쫄아서 몸을 숨기다니.
심장을 뽑아 잘근잘근 씹어 위엄을 되살리겠다!
하며, 목청을 돋우어 소리쳤다.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이 어르신이 마시는 물에 족발을 담그고 있느냐!”
물장구를 치며 걸어온 청년은 바로 홍경이었다.
홍경이 내려다보니 얕은 계곡 아래, 머리가 벗겨진 중년인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시비를 거는 모양새였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양손을 맞대 공수하며 먼저 사과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 됐소이다. 아래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 사과할 테니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상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닥쳐라. 이 개불알 같은 놈! 감히 본좌에게 구정물을 마시게 하다니, 목숨으로 사죄하거라!”
펄쩍 뛰어오른 석개두가 홍경의 가슴을 향해 세차게 손을 뻗었다.
불에 달군 쇳덩이처럼 시뻘겋게 변한 손바닥에서 사기(邪氣)가 맴돌았다.
석개두가 자랑하는 규환마라장(叫喚魔羅掌)이었다.
강력한 경력이 실린 일장이 홍경의 가슴을 때리는 순간!
푸우우-
피 분수를 뿜으며 석개두가 날아갔다.
바닥에 철퍼덕 떨어진 석개두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피를 울컥울컥 쏟아냈다.
“쿨럭, 컥···. 이, 이렇게 강력한 반탄강기라니···. 커흑.”
심장을 터뜨릴 생각으로 날린 7성의 규환마라장이다.
그런데 청년은 손바닥만큼 겉옷이 터져나간 것 외에는 너무 멀쩡했다.
설마 저 허여멀건 하게 생긴 서생 놈이 엄청난 고수였단 말인가.
그때 청년의 찢어진 겉옷 안쪽, 금빛으로 빛나는 비단 내의가 눈에 들어왔다.
석개두의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서, 설마···. 전국칠보, 천잠보의?"
전국칠보(全國七寶) 천잠보의(天蠶寶衣).
천잠보의는 전국 시대에 등장한 일곱 가지 신기(神器)중 하나로 상대의 공격을 되돌려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겨우 이딴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 드는 걸 보니, 필시 이름 높은 마두(魔頭)가 틀림없으렷다! 오늘 내 손을 더럽혀서라도 천하의 근심을 하나 덜어줘야겠다.”
홍경이 바위를 밟고 계곡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허···.’
석개두는 속으로 헛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1장(약 3m)밖에 안 되는 높이를 낑낑대며 내려오는 게, 아무리 봐도 무공을 익힌 몸놀림이 아니었다.
저런 허접쓰레기가 7성의 규환마라장을 맞고도 되려 자신에게 내상을 입힐 정도의 고수일 리는 없었다.
무림 맹주 만원갑조차도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석개두는 청년이 천잠보의의 주인임을 확신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하필 전설의 천잠보의를 입은 놈을 공격했으니···.’
홍경이 다가오자, 석개두는 양손을 맞잡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애원했다.
“고, 공자! 용서해주시오. 내가 큰 실수를 했소. 오늘 힘든 일을 많이 겪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사나워져서 그랬소. 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쿨럭! 쿨럭!”
천잠보의를 입은 상대는 독과 같은 수단이 아닌 이상,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다.
내상으로 내공의 수발도 힘든 지금, 살기 위해선 비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다.
“자비? 좋지.”
석개두의 뒷머리를 붙잡고 물가로 끌고 가 머리를 푹 담가 주었다.
보글보글, 꼴깍꼴깍.
강제로 물을 마시게 된 석개두는 팔다리를 바둥거리며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잔뜩 물을 먹인 후 머리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목마르다고 직접 물도 먹여주고···. 내가 이리 자비로운 사람이다.”
“커허헉. 사, 살려···. 푸헉.”
다시 머리를 처박아 물을 잔뜩 마시게 해주었다.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석개두의 배가 크게 부풀어 올랐다.
딱 죽기 직전에 머리를 들어 올려 주었다.
석개두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살려, 살려, 돈, 돈, 가진 거, 다 바치겠···.”
또 물을 먹이려다 가진 걸 다 바치겠다는 말에 손을 멈췄다.
“그래? 내놔봐.”
“뒤, 허리 뒤, 전낭이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들쳐 보니 과연 허리 뒤에 전낭이 매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안을 뒤져보니 전표가 가득했다.
못해도 2〜3천 냥은 될 듯했다.
이 정도면 살려줘도 되겠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홍경이 기분 좋게 전낭의 입구를 열고 안에 든 전표를 챙기려는 그때.
석개두의 엉덩이에서 뿌앙! 지독한 소리와 함께 방귀가 터져 나왔다.
“헙!”
그것은 단순한 방귀가 아니었다.
무연독비(無煙毒屁).
운남의 한 부족에 전해 내려온 비전의 구명절초(救命絶招)로 위기의 순간 평소 뱃속에 품어둔 독기를 내뿜어 공격하는 비술이었다.
단 한 호흡만 들이마셔도 의식을 잃게 되는 극독(劇毒)이다.
이 비전의 절초로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벗어났던가.
석개두는 확신했다.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목숨도 챙기고, 덤으로 보물도 챙기고.
고개를 돌려 홍경의 상태를 본 석개두는 경악해 눈을 크게 치떴다.
멀쩡했다.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코를 잡고 있을 뿐.
단 한숨도 들이마시지 않은 모양이다.
홍경은 방귀 때문에 몸을 젖혀 거리를 벌리고 있었다.
달아날 기회였다.
남은 내공을 모아 손바닥으로 바닥을 쳐 반동으로 몸을 날렸다.
풍덩-
물속으로 뛰어든 석개두는 허겁지겁 헤엄쳐 다시 아래 폭포로 뛰어내렸다.
홍경은 석개두가 도망가든 말든 내버려 두었다.
독방귀 정도에 중독될 일은 없지만, 냄새가 너무 지독해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놈에게서 뺏은 전표를 행낭 안에 집어넣고, 허공을 향해 손을 한 번 휙 휘저었다.
손길을 따라 일진광풍(一陣狂風)이 불어 독기를 하늘 높이 날려 버렸다.
홍경은 독기가 바람에 흩어지는 걸 확인한 후 산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
홍경이 떠나고 얼마 후.
한 노인이 검을 타고 어검비행(御劍飛行)으로 홍경이 있던 그 장소 위를 지나고 있었다.
“구화마두야. 어디에 숨었느냐.”
노인의 정체는 석개두를 쫓아온 무림 맹주 만원갑이었다.
한참 아래를 살피던 만원갑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다.
“커흡!”
만원갑이 지나던 부근은 하필 홍경이 허공으로 날려 버린 독기가 있던 곳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독기를 맡아버린 만원갑은 끝내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바닥에 닿기 직전, 겨우 정신을 차린 만원갑은 다급하게 있는 힘껏 몸을 비틀며 손으로 바닥을 후려쳤다.
쾅! 챙그랑!
흙먼지가 일어나며 만원갑의 몸이 장난감처럼 튕겨 올랐다.
함께 떨어진 검은 저 멀리 벼랑 아래로 날아가 버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만원갑이 고개를 들었다.
“크흑···.”
부들부들.
사지에 경련이 일었다.
충격이 너무 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왼손은 박살이 났고, 하체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목숨은 구했지만, 아무래도 척추가 부러진 것 같았다.
“허억, 헉···.”
만원갑은 거친 숨을 토해내며, 한 손으로 힘겹게 앞으로 기어나갔다.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무림의··· 평화가···. 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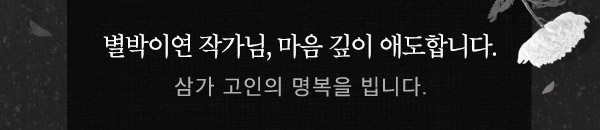



![뭐? 내가 망캐라고? [E] 뭐? 내가 망캐라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107/002/R8lpim7fDrcUhpdx.jpgtb.jpg)


![독불장군 신권철 [E] 독불장군 신권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425/001/FwtXQVHAyg7d6fBo.jpgtb.jpg)
![군림천하 [E] 군림천하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829/001/KQ9eJGf756qtWcqz.jpgtb.jpg)
![메카닉군주 [E] 메카닉군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212/000/b34TOghmD6HQig63.jpgtb.jpg)
![천애지각 [E] 천애지각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1010/001/VGtdp6ZggpGG6JLx.jpgtb.jpg)
![삼자대면 [E] 삼자대면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1010/003/Tjy47mhxA33aMWGL.jpgtb.jpg)
![비뢰천신 [E] 비뢰천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627/000/8FQkWX2Gq8cJrRQk.jpgtb.jpg)
![[개정판] 절대마신 [E] [개정판] 절대마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2/7GO7x7xvU9YZCc7m.jpgtb.jpg)
![천룡전기 [E] 천룡전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418/003/Dll8prfKLlMtcFFN.jpgtb.jpg)
![마왕의 게임 [E] 마왕의 게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1/004/kiDu34bb4ZKXn810.jpgtb.jpg)
![무적명 [E] 무적명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2/004/Q3NrY5L4gBomWliR.jpgtb.jpg)
![척안의 마도사 [E] 척안의 마도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8/001/o4s9pDChKGlt0zTE.jpgtb.jpg)
![너의 진심이 들려 [E] 너의 진심이 들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017/004/MfrJw8zTYtGQNV5T.jpgtb.jpg)
![마졸 귀환록 [E] 마졸 귀환록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1219/003/HIQPmnD6ugBQA5W3.jpgtb.jpg)
![무림사계 [E] 무림사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112/003/5rdDo7SDXe1VqW5Y.jpgtb.jpg)
![재벌강점기 [E] 재벌강점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508/004/aIBJ9u9YXsD5eLZy.jpgtb.jpg)
![혈기린외전 [E] 혈기린외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130/002/TCeYny2K2fIHSYOl.jpgtb.jpg)
![백염의 심판자 [E] 백염의 심판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610/002/G3758NGcmElZg9By.jpgtb.jpg)
![독보건곤 [E] 독보건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1230/001/K266QoQC0CuF9nY8.jpgtb.jpg)
![환생천마 [E] 환생천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811/003/WumOfA2Xi4kdQgsM.jpgtb.jpg)
![다크메이지 [E] 다크메이지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302/002/bVUUsbsAAqSqVWmL.jpgtb.jpg)
![환생행 [E] 환생행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118/000/WVrY36pmwK8hVp7X.jpgtb.jpg)
![1분마다 돈을 버는 각성자 [E] 1분마다 돈을 버는 각성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107/003/UyXgcVVkxkYUHRXY.jpgtb.jpg)
![[개정판] 절대강호 [E] [개정판] 절대강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0/L21c6WTac8xjIMV9.jpgtb.jpg)
![화선무적 [E] 화선무적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5/003/DxpbuMr1ZqzYSvZ7.jpgtb.jpg)
![천의 허지훈 [E] 천의 허지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322/003/k1gJCHcpdqc5Rc78.jpgtb.jpg)

Commen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