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쾌락 없는 책임.

# 36. 쾌락 없는 책임.
오늘 은교교는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었다.
그래서 혼례식에 초대를 받았으면서도 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중이었다.
‘달거리도 아닌데···.’
손톱에 거스러미가 스친 것처럼 이상하게 짜증이 났다.
자신도 이유를 몰라 더 짜증이 났다.
“쯧···.”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가는 걸 본 은교교는 지붕에서 내려와 주가반점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으로 돌아가 잠이나 실컷 자야겠다, 생각하며.
그때 맞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사내가 남다른 미모의 은교교를 발견하곤 눈빛을 빛냈다.
사내는 눈처럼 하얀 경장에 영웅건으로 멋을 낸 느끼하게 생긴 남자였다.
사내가 다가오자 은교교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오늘은 면사를 쓰지 않은 탓에 저딴 놈팡이의 눈에 띈 것이다.
면사를 챙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은 이상하게 정신이 없었다.
“소저. 참으로 천상의 선녀가 따로 없구려. 내가 좋은 가게로 안내할 테니, 함께 식사나 합시다.”
느끼남이 금원보를 슬쩍 내보이며 손을 내밀자, 은교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고 있던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버렸다.
콰장창!
“켁!”
비틀거리는 사내 머리 위로 갑자기 그늘이 졌다.
사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수많은 손 그림자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마치 천수관음(千手觀音)이 현현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관음이 아닌 야차였다!
난화첩첩(亂花疊疊).
어지러이 휘날리는 꽃잎처럼 수없이 흩어진 은교교의 손바닥이 사내의 뺨에 불꽃 싸대기를 날렸다.
쫘좌좌좌좌짝!
“끄어···.”
돼지 오줌보처럼 얼굴이 탱탱 부어오른 사내는 신음을 토하며 바닥에 철퍼덕 쓰러졌다.
“흥.”
사납게 콧김을 뿜으며 돌아선 은교교는 뭔가 부족했는지, 걸음을 되돌려 사내에게 다가갔다.
“본녀가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너 같은 놈이 함부로 수작을 걸어도 될 만큼 쉬운 여자로 보이더냐?”
분노를 토하며 쓰러진 사내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
“요, 용서, 용서하시오. 용서··· 끄윽···.”
무자비한 발길질에 사내는 벌레처럼 꿈틀대다 끝내 실신하고 말았다.
“퉷!”
은교교는 사내를 완전히 걸레짝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야 손을 털며 자리를 떴다.
그녀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사저님.”
이번엔 천외비선의 제자였다.
“무슨 일이냐.”
“유 장로께서 급히 복귀하라 전하셨습니다.”
“···알았다.”
은교교는 손짓으로 사내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철썩, 뺨을 후려갈겼다.
“다음에 또 내 앞을 막아서면 목을 비틀어 버릴 줄 알아라!”
“···네. 사저님.”
사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은교교는 남자가 앞에서 말을 거는 걸 극히 싫어했다.
남자들의 욕망 가득한 시선에 질린 탓이다.
천외비선의 제자라도 남자라면 옆이나 뒤에서 말을 걸어야 한다.
근래 홍경을 상대하며 얌전하게 지내 깜빡했지만, 그녀의 본성은 사나운 암호랑이였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주저 없이 목을 물어뜯어 버리는 호랑이.
강산역개, 본성난이(江山易改 本性難移)
강산은 쉽게 바뀌어도,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고 했다.
어쩌면 뺨 한 대로 끝난 게 다행인지 모른다.
돌아가는 은교교의 뒷모습을 보며 사내는 불안한 듯 자신의 목을 쓰다듬었다.
***
귀주성의 모처.
호출을 받고 본부로 돌아온 은교교.
정보 상인의 특성상 본부는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고, 이곳의 위치는 은교교 같은 내문제자 일부만이 알고 있었다.
“은 사저.”
문을 지키고 있던 제자가 은교교를 보자 살갑게 인사했다.
“사부님은?”
“연화동에 계셔요.”
문지기 제자가 손짓하자, 뒤에 엎드려 있던 개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은교교의 주변을 돌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천리추종향(千里追從香) 같은 추적용 약물이 묻어있지 않은 지, 금지 물품을 반입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절차였다.
“손목을 보여주세요. 사저.”
손목을 걷어 수궁사의 붉은 점을 보여주자, 문지기 제자는 약물을 묻힌 천으로 그 부분을 박박 닦아 지워지지 않는지 확인했다.
“어째 검열이 더 엄격해진 것 같네.”
잠깐 머뭇머뭇하던 문지기 제자는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전에 혜화 사저의 수궁사가 지워진 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수궁사의 검사는 특히 엄격히 검열하게 된 것이에요.”
수궁사가 지워졌다니, 누군가와 정을 통했다는 말이 아닌가.
은교교는 충격에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상대는?”
“남궁가의 셋째, 남궁인이래요. 하지만 그자는 혜화 사저와의 관계를 부인했어요.”
“그럼 혜화 사저는?”
“심문 중에··· 그자가 부인했단 소릴 듣고는··· 벽에 머릴 부딪혀 자살했어요.”
“아···.”
은교교는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사문을 배신했다 의심받으면 혹독한 심문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심문 중 목숨을 잃거나 폐인이 된다.
그녀는 아마 정인(情人)을 생각하며 고문을 버텼으리라.
그가 구해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하지만 정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한 걸 알게 되자 희망을 잃고 자결한 것이리라.
“비정하구나. 어찌 된 사내가 여인에게 손을 댔으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무림에서 정보 상인에 대한 인식은 아주 형편없었다.
정보상에게 고객은 있어도 적은 없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보를 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상은 박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정보상 출신의 여인을 남궁가 같은 명문 세가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현실을 알지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사문의 처사도 그랬다.
남궁가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불쌍한 제자만 족치다니.
답답한 마음에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관문을 통과한 은교교는 안으로 들어가 사부의 거처인 연화동으로 향했다.
“왔느냐.”
입구에 들어서자, 기척을 느낀 사부 유 장로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사부님. ”
제자의 인사에 유 장로는 고개를 끄덕여 화답한 후 무뚝뚝한 얼굴로 물었다.
“요즘 그자와 관계는 어떠하냐.”
“나쁘지 않··· 아, 아주 좋습니다. 서로 흉금을 터놓을 정도로 가까워져 이제 곧 비밀을 알아낼···.”
“그 건은 되었다.”
“네?”
“상아와 은수가 주화입마에 빠졌다. 다른 제자들은 다음 경지를 코앞에 두고 주저앉아 버렸어. 느긋하게 뒤나 캐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시간이 없어.”
“그럼···.”
“그 자에게 설삼을 더 지원해달라고 해. 비동을 열지 못한다면 투자한 다섯 뿌리도 날리는 셈이니 거절하지 못할 테지.”
무작정 천년설삼을 더 내놓으라 말하라니.
은교교는 숨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게 그리 꺼내기 쉬운 말인가.
게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게 합당한 일일까.
“사부님. 아무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에는···.”
“너와는 관계가 좋다 하지 않았느냐.”
“그, 그렇긴 하지만···.”
“교아야. 자신을 가져라. 네가 배운 모든 것을 발휘하면 세상 어떤 사내도 네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사부가 지시를 물릴 것 같지 않으니, 은교교는 울상을 지었다.
“명년(明年) 8월에 유성이 자미원(紫微垣)을 침범할 것이다. 자미대제(紫微大帝)의 기운이 약해지는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유 장로는 교교의 어깨를 붙잡고 뜨거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교아야. 네 손에 천외비선의 미래가 달렸다.”
어깨에 올린 사부의 손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사문의 처사가 불만스러웠지만, 거부할 순 없었다.
그녀에겐 그럴 힘이 없었다.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답할밖에.
“명에 따르겠습니다. 사부님.”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내 자랑스러운 제자지.”
정중히 인사하고 뒤로 물러나 나왔다.
은교교의 입에서 다시 한숨이 흘러나왔다.
***
주가장에 또 하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황 노인에게 손자가 태어난 것이다.
홍경은 황 노인에게 산모를 위한 좋은 약재와 은자 1천 냥을 선물했다.
“도, 도련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혼인했으니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면 안 되지만, 황 노인은 여전히 홍경을 도련님이라 불렀고, 그게 더 정겨워 홍경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과하긴. 황노는 갓난아기 때부터 날 돌봐줬으니 내 친할아버지나 마찬가지야. 황노의 손자면 내 조카잖아. 숙부가 조카한테 이 정도 선물도 못 한다면 말이 되겠어? 내가 춘식이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춘식은 딸만 다섯인 황 노인의 늦둥이 막내아들이었다.
홍경보다 두 살이 어렸는데, 어릴 땐 둘이서 나무작대기를 들고 해가 질 때까지 들판을 쏘다니다 어른들에게 잡혀 오기도 했고, 머리가 굵어진 후에는 남의 집 담을 넘어 술을 훔쳐먹는 등 같이 사고를 치고 다닌 사이였다.
그런 춘식이 홍경보다 먼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은 것이다.
“아, 그리고 뽕밭을 관리할 사람을 필요한데, 일할 사람도 뽑고, 관리도 하고 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거 춘식이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도련님!”
뽕밭의 관리는 원래 양소의 친척이 맡아 하던 자리였다.
관리인은 새로 사람을 뽑고, 일을 할당하고 조율하는 등 권한이 막강했다.
보통 이런 곳은 친인척이나 믿고 맡길 만한 수하에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자리에 춘식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부쳐 먹을 밭떼기도 없는 집안에 일자리를 못 구해 빌빌거리는 아들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까.
절로 목이 메어 왔다.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러지 마. 나야말로 여태까지 키워준 은혜를 다 갚지 못했는걸.”
홍경은 황 노인을 덥석 끌어안고 말했다.
“황노. 내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줘.”
“흐흑···. 도련님···.”
황 노인은 끝내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
뽕밭을 끝으로 양가에서 가져온 사업의 정리가 끝이 났다.
비단 사업의 관리는 부친이 전담할 테니, 홍경은 이제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해야 하는데, 천외비선에 의뢰하려니 요즘 은교교가 보이질 않았다.
근 한 달째다.
늘상 가게에 붙어 있더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녀를 생각하며 가게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은교교가 와 있었다.
“은 소저. 오랜만이오. 한동안 안 보이더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사문에 일이 있어 사부님을 뵙고 왔어요.”
“그랬군.”
“왜요. 보고 싶었나요?”
“이를 말이오. 당연히 보고 싶었지.”
“헹.”
홍경의 너스레에 은교교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성혼까지 하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하. 친구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무슨 문제란 말이오.”
“으흥. 그런 의미라면 나도 보고 싶었다고 해야겠군요.”
살짝 눈웃음을 치는 게 보는 사람이 녹을 정도로 요염해 보였다.
하지만 표정과 달리 억지로 짜낸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다.
홍경은 은교교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챘다.
뭔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 시간 괜찮소? 의뢰할 게 있는데.”
“내 방에서 한잔하며 이야기해요. 좋은 술을 구했거든요.”
“그럽시다.”
2층, 은교교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상자에서 표주박을 꺼내 들었다.
진짜 표주박이 아니라 표주박 모양으로 빗은 술병이었다.
“모대주(茅臺酒)예요. 이건 그중에서도 특별히 황제에게 진상하는 물건인데, 연줄을 통해 입수했죠.”
“귀주에 다녀왔소?”
모대주는 귀주성의 특산주니 물어본 것이다.
“비밀.”
은교교는 탁자 위에 잔을 두 개 놓고 술을 따랐다.
짙은 술 향기가 피어올라 코끝을 자극했다.
공배상류만실향(空杯尙留滿室香).
잔은 비어도 향기는 방안에 가득 남는다는 시구와 잘 어울리는 짙은 주향(酒香)이 일품이었다.
“좋은 술이 있는데 안주가 아쉽군.”
갑자기 제자리에서 한 바퀴 휙 돌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접시를 내려놓았다.
“어?”
은교교가 눈을 껌벅거렸다.
분명 빈손이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만두가 났을까?
“하나로는 아쉽지.”
또 한 바퀴를 돌자 손에 바싹하게 튀겨놓은 과파육이 들려있었다.
“머야! 머야!”
은교교는 홍경의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또 만져보며 속임수의 실체를 확인하려 했다.
“은 소저. 외간 남자의 몸을 너무 만져대는 것 아니오?”
홍경의 지적에 은교교는 얼굴이 붉어져 슬며시 물러났다.
“휴···. 들킬 뻔했군.”
능청을 떨며 다시 한 바퀴 돌아 요리를 꺼냈다.
이번엔 커다란 접시에 맛깔나게 구워진 오리구이가 들려있었다.
“머야, 머야, 머야!”
동그란 눈이 쉴새 없이 깜박였다.
은교교는 다시 달려들어 홍경의 온몸 구석구석을 마구 더듬어 댔다.
“어허. 아무것도 없다니까.”
“찾았다! 춘권? 춘권치곤 말랑한데···.”
“그거 아니오!”
아무리 떼어 내려 해도 악착같이 달라붙어 더듬어 대니 홍경도 포기하고 은교교가 만족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왜 없지? 왜 없지?”
요리는 요술행낭에 들어있던 걸 꺼낸 것이니, 당연히 뒤져도 나올 게 없었다.
아무리 뒤져도 뭐가 나오지 않자, 은교교는 귀엽게 눈을 흘기며 노려보았다.
“도대체 어디서 꺼낸 거예요. 빨리 가르쳐줘요.”
“비밀이오. 비밀. 자자, 식기 전에 드시오.”
재미난 요술을 선보인 덕에 조금 전까지의 어두운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도 안 것이다.
자신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홍경이 재주를 부렸다는 걸.
교교에겐 오랜만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술잔을 비우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시답잖은 농담에 깔깔거리기도 하면서 회포를 풀었다.
적당히 분위기가 풀어지자, 홍경은 원래 하려던 의뢰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도 비급을 좀 구했으면 하는데, 화염 계열과 빙공 계열로. 대단한 신공은 필요 없고, 입문공정도면 족하오. 그리고 작물도 좀 구해주시오. 만디오카, 혹은 카사바라고 불리는 식물이오. 아마 남만 쪽에서 구할 수 있을 거요.”
“문제없어요. 우리 천외비선이 못 구하는 물건은 없으니까요.”
“설삼은 빼고 말이지.”
“······.”
설삼이라는 말에 은교교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설마 알고 한 말은 아니겠지.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기분이었다.
“왜 그러시오.”
농담으로 꺼낸 설삼 이야기에 반응이 싸늘해 물어보았다.
“공자···.”
은교교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 천년설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설삼을 복용한 제자들이 경지 상승에 실패한 현 상황과 추가 지원을 바라는 사문의 요구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와주세요. 공자.”
홍경은 술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 소저.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시오? 잃은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내 손에 들린 게 약 패라면 들어간 돈이 많더라도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 거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도박에 비유한 것은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건 도박 같은 게 아니에요. 공자.”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이게 도박이 아니면 뭐요.”
홍경이 후-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소. 무려 열 뿌리요. 그냥 씹어먹어도 내공이 폭발할 텐데, 거기에 온갖 좋은 약재를 섞어 효과를 폭증시킨 걸 먹이고도 실패했다는 게 말이 되오? 게다가 그걸 먹인 제자들은 고르고 고른 인재들일 텐데, 몽땅 실패했다고?”
은교교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게 우리 같은 정보 단체에 자질이 뛰어난 제자는 드물어요. 고르고 골랐다 해도 그래요. 명문 대파의 가장 자질이 낮은 제자라도 우리보단 훨씬 뛰어나죠. 그리고 천외비선의 내공 심법은 그다지 뛰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가진 최상급 무공은 전부 비동에 있어 익히질 못하니까···.”
자질도 떨어지고 내공심법도 떨어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은교교는 자기 입으로 사문이 대단치 않다는 걸 이야기하려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도 이상하단 말이오. 내 생각엔 누군가 천년설삼을 빼돌리고 다른 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천년설삼의 효과를 홍경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홍경의 판단이니, 옳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은교교는 절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천외비선의 제자라면···.”
배신자가 나올 리 없다는 교교.
“화신교의 금모가 날 찾아낸 건 천외비선에서 정보가 새 나갔기 때문 아니오?”
뜨끔해진 은교교가 다급히 변명했다.
“그건··· 그건 접수를 담당했던 외문제자가 일으킨 문제였어요. 당연히 그자는 처벌을 받았고요. 사문의 핵심인 내문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어려서부터 사문에서 자랐어요. 사문은 가족이고 사부는 부모님과 마찬가지예요. 또 우린 다른 문파와 달리 대우가 아주 좋아요. 돈 때문에 배신할 일은 절대 없어요. 비동만 열리면 최상승 무공도 마음껏 고를 수 있는데···.”
돈도 아니고 무공도 아니라면 남은 건 하나.
“그럼 애정 문제구먼.”
“애정?”
“동이의 낙랑공주는 적국의 왕자에 반해 나라까지 팔아먹었소. 애정이 얽히면 가족도 나라도 안중에 없는 거요. 하물며 사문이야.”
누군가 사랑에 눈이 멀어 사문을 배신했을 거라 주장하는 홍경.
순간 교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약을 가공하고 개발하는 일은 약선동(藥仙洞)이 주관한다.
그곳의 주인은 장로 진화였는데, 자살한 혜화가 바로 진 장로의 제자였다.
설마 혜화가 설삼을 빼돌려 남궁가에 넘긴 걸까?
‘아닐 거야.’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설령 그게 맞는다고 해도 홍경에게 배신자가 있었소 하고 말할 수는 없었다.
배신자가 다 빼 먹었다 하면 무얼 믿고 설삼을 지원해 주겠는가.
교교는 절대 아니라며, 천외비선의 제자들은 남자와 눈이 맞아도 들킬 수밖에 없다며 손목의 수궁사(守宮砂)를 보여주었다.
수궁사를 본 홍경이 코웃음을 쳤다.
“주사(朱砂)를 먹여 키운 도마뱀의 피를 발라 놓으면 남자랑 잠자리를 가지기 전까진 안 지워진다고? 그냥 미신 아니오?”
“아니에요! 수궁사는 진짜라고요!”
한무제(漢武帝) 때부터 내려온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이라며, 효과가 진짜임을 주장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지워진다고?”
“절대!”
“문질러봐도 되오?”
“얼마든 지요. 앗, 침은 안 돼요. 싫어요!”
혀를 내밀고 침을 묻히려던 홍경은 머쓱해 입을 다물고, 대신 손수건에 술을 약간 묻혀 손목을 문질렀다.
뽀득뽀득.
때를 밀 듯 빡빡 문질렀는데도 손목의 점은 그대로였다.
“봐요. 맞죠? 맞죠?”
의기양양한 표정이 어쩐지 얄밉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밀어서 안 되면 당겨보자.
홍경은 손끝에 내공으로 흡력을 일으켜 수궁사를 빨아들이는 느낌으로 문질러 보았다.
뭔가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 손을 뒤집어 보니, 손끝에 빨간 점이 생겨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은 깨끗하게 변해있었다.
수궁사가 옮겨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워진 것.
“하하, 보시오. 수궁사가···. 아?”
“어?”
홍경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등허리가 서늘해졌다.
저건 장난으로라도 절대 지워선 안 되는 것이었다.
홍경은 다급하게 반대로 되돌려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이게, 아니, 이게···.”
순결의 증거를 어이없이 잃어버린 은교교는 충격에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으, 은 소저···.”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변하더니 덜컥, 고개를 떨구며 실신하고 말았다.
“은 소저! 맙소사!”
- 작가의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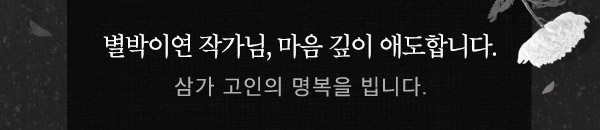



![뭐? 내가 망캐라고? [E] 뭐? 내가 망캐라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107/002/R8lpim7fDrcUhpdx.jpgtb.jpg)


![통일 코리아 제국 [E] 통일 코리아 제국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329/002/MrArUYyRCp8YWuyU.jpgtb.jpg)
![무림사계 [E] 무림사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112/003/5rdDo7SDXe1VqW5Y.jpgtb.jpg)
![종천지애 [E] 종천지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1/001/rannVAWsXrOuJqiy.jpgtb.jpg)
![무당소사숙 [E] 무당소사숙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826/002/KzN6oNiRiNBISFxZ.jpgtb.jpg)
![회귀행 [E] 회귀행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2/000/BEkP4FZPxCFraC2L.jpgtb.jpg)
![타임홀릭 [E] 타임홀릭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427/004/LZpHebvSbHgRO4MU.jpgtb.jpg)
![재벌강점기 [E] 재벌강점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508/004/aIBJ9u9YXsD5eLZy.jpgtb.jpg)
![역천의 발뭉 [E] 역천의 발뭉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613/001/lacQ9Rdf3qbLk2Bu.jpgtb.jpg)
![속가제자 [E] 속가제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613/001/FEm4vYrhDH14b0iQ.jpgtb.jpg)
![이것이 법이다 [E] 이것이 법이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01/000/JGScEFjfjuEfTcgc.jpgtb.jpg)
![앱설루트 [E] 앱설루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403/001/mYrMrukaLbQInLSo.jpgtb.jpg)
![다 쓸어버린다 [E] 다 쓸어버린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627/003/52U32sj7mhrpTIxB.jpgtb.jpg)
![환생천마 [E] 환생천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811/003/WumOfA2Xi4kdQgsM.jpgtb.jpg)
![책을 읽으면 경험이 쌓여! [E] 책을 읽으면 경험이 쌓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824/001/GZZIbmD0Wku7aKx2.jpgtb.jpg)
![척안의 마도사 [E] 척안의 마도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8/001/o4s9pDChKGlt0zTE.jpgtb.jpg)
![[개정판] 절대강호 [E] [개정판] 절대강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0/L21c6WTac8xjIMV9.jpgtb.jpg)
![돈 버는 스케일이 계속 커져! [E] 돈 버는 스케일이 계속 커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0614/001/eS6Cd8wo16nwHHOp.jpgtb.jpg)
![화산검신 [E] 화산검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1010/004/YOTWh159FwUf0UEU.jpgtb.jpg)
![천룡전기 [E] 천룡전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418/003/Dll8prfKLlMtcFFN.jpgtb.jpg)
![다이너마이트 [E] 다이너마이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6/001/SSY4T1JLabQJO4U9.jpgtb.jpg)
![재벌집 둘째 딸 [E] 재벌집 둘째 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1016/004/LvLoJbQfIaPkuuux.jpgtb.jpg)
![최강신화 [E] 최강신화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7/001/hM9A3o1dNwI5Un04.jpgtb.jpg)
![재벌 야망 [E] 재벌 야망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1120/004/CdoA7buIIan0CHjg.jpgtb.jpg)
![귀환 마도사 [E] 귀환 마도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407/004/25cXbI0JnL1kdjyV.jpgtb.jpg)
![에틸렌의 소공자 [E] 에틸렌의 소공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919/003/560Htj90vi7KZFhO.jpgtb.jpg)

Commen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