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나도 강해지고 싶어.

# 51. 나도 강해지고 싶어.
늦은 밤.
등불로 어둠을 걷어 낸 주가장의 정원 한쪽에선 글미와 숙희의 송별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기절한 숙희를 방으로 옮기고 글미의 도움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데 성공했다.
깨어난 숙희에게 흙바닥을 뒹굴어 옷이 더러워져 그랬다고 하자, 숙희는 별말이 없었다고 한다.
박치기로 기억이 날아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연회 내내 숙희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 연회가 끝날 무렵, 숙희는 술기운이 제법 오른 듯 눈빛이 몽롱해졌는데, 갑자기 홍경을 보며 혀 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겁해요.”
“엉?”
“비겁하다고요!”
“······.”
설마, 그건가 싶어 홍경은 속이 뜨끔했다.
“동전을 던지면 바닥에 닿을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개당고 이야기는 아니었다.
비무를 시작할 때 동전에 낚인 게 억울했던 모양인데, 소심한 성격이라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나 보다.
“내가 준비됐냐고 물었을 때 허 소저는 언제든 들어오라고 했지. 그럼 동전이 떨어지든 말든 이미 비무는 시작된 게 아니오.”
“그, 그치만···. 동전을 던지면 누구나 저게 신호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나요?”
“무공에도 실초가 있고 허초가 있지 않소? 동전을 던진 건 일종의 허초였지. 원래 허초란 게 사람을 낚는 수법 아니오? 나도 동전으로 낚은 것뿐이오.”
“말도 안 돼. 순 억지야.”
“아깐 전력을 다해달라더니.”
“그, 그게 무슨 전력이에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건 형부의 전력을 다한 주먹이었지, 전력을 다한 얍삽이가 아니었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내 전력이오. 싸움은 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소.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실력이오.”
“그건 사파의 논리에요.”
“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오. 상대를 공격할 때 정직하게 공격한다면 그게 먹히겠소?”
“사부님은 늘 제 검이 정직하다고 칭찬하셨어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제 검의 길이에요. 정도를 걷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은 숙희의 꽉 막힌 사고방식에 답답함을 느꼈다.
“정직한 검이라는 게 꼭 칭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소.”
“아니···.”
“내 배움이 얕아 어려운 말은 잘 모르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어가 하나 있소. 상선약수(上善若水). 지극한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둥근 잔에 담던, 네모난 그릇에 담던 형태는 달라져도 본질이 변하는 법은 없소. 비겁함과 유연함의 차이를 깨닫길 바라오.”
말문이 막힌 숙희는 탁자에 엎드려 고개를 파묻었다.
무공도 모르는 사람이 왜 아는 척이야!
짜증 나.
정직한 검이 칭찬이 아니라고?
니가 뭘 알아!
상선약수?
지랄 말라고 해!
“흐흑···.”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사부의 말이 칭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사형들도 늘 하는 말이었다.
네 검은 너무 정직하구나.
그저 오기였을 뿐이다.
정직한 검으로 대성해 보이겠다고.
진짜 칭찬으로 바꿔 보이겠다고.
무공도 모르는 사람에게 들은 한 마디가 너무 뼈아팠다.
“희야···.”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던 글미와 수향은 울음까지 터뜨려버린 숙희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다.
마지막 날의 연회 분위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다니.
그때 갑자기 숙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정원 한쪽으로 걸어가, 긴 나뭇가지를 하나 뚝 부러뜨려버렸다.
성질이 나서 정원을 망가뜨리려는 걸까.
“희야!”
글미가 나서려는 데 숙희가 뭔가 하려는 걸 알아챈 듯 수향이 손으로 제지했다.
숙희는 손에든 나뭇가지를 검처럼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금껏 배운 익숙한 초식들을 하나하나 펼쳐냈다.
‘정직한 검.’
수향은 숙희의 검에서 그 뜻을 바로 알아보았다.
변주도 강약도 없이 배운 형식을 그대로 펼쳐내는 교재 같은 검.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선 휙, 휙, 바람 가르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다.
숙희는 한순간 깨달았다.
나뭇가지에서 한 번도 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하찮은 나뭇가지조차 이럴진대, 항상 같은 초식을 펼쳐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온도, 그날의 습도,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기분···.
그리고 그날의 상대.
바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다.
아니,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걸까?
홍경이 말한 본질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 숙희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정직한 검이란 뭘까.’
배운 대로만 펼쳐내는 게 정직한 검일까.
생각대로, 의도대로, 내 의지가 온전히 검로에 깃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정직한 검이 되는 게 아닐까.
휙, 휙.
기세가 바뀌고 펼쳐내는 초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낸 사람처럼 환희에 찬 표정.
“도와줘.”
그녀가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자신이 찾은 게 옳은 답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수향과 글미도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다가갔다.
수향과 숙희가 나뭇가지를 검처럼 휘두르며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숙희의 달라진 검세에 수향이 감탄을 터뜨렸다.
“멋져!”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껍질을 벗은 듯 그녀의 검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좋아! 간다!”
힘차게 달려들던 글미는 느닷없이 코앞에 나타난 뾰족한 나뭇가지에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꺅!”
어느샌가 숙희가 나뭇가지를 쭉 내밀어 공격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수향과는 달리 글미는 단 한 초식도 버텨내지 못했다.
수준이 급격하게 벌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꺅!”
또 한 번 주저앉고 말았다.
연습 상대조차 되지 못할 정도의 격차.
어떻게 단 한 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글미는 그대로 주저앉은 채 수향과 숙희의 검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수향이 나뭇가지를 거두고 뒤로 물러났다.
받아줄 상대가 물러났음에도 숙희는 혼자 초식을 이어갔다.
몰아지경(沒我之境).
달빛에 흠뻑 젖은 검무는 지극히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다.
그녀의 주변으로 은은한 매화향이 느껴졌다.
“매화를 피워냈어!”
감격한 목소리로 수향이 외쳤다.
화산의 검수들이 꿈에도 바라던 그 경지에 도달한 증거였다.
이윽고 검무를 그친 숙희가 사뿐사뿐 걸어와 홍경에게 정중히 포권했다.
“형부. 감사해요. 형부는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아니, 뭐, 평생까지야. 하하.”
홍경은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아무튼, 축하하오. 내 말은 단지 계기가 되었을 뿐, 이건 모두 허 소저가 쌓아온 토대가 단단해서 이룬 성취요. 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간 도달할 것이었지. 그러니 평생의 은인은 너무 과하오.”
“아니에요. 형부가 깨우쳐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그대로였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요.”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글미가 일어나 홍경에게 달려들었다.
“형부! 나도 깨달음!”
“엉?”
“나도 상선약수 같은 거 가르쳐줘요! 빨리! 빨리이-.”
글미가 홍경의 팔을 잡아당기며 떼를 썼다.
“비 소저. 내 이야기에 허 소저가 깨달음을 얻은 건 그저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오. 내가 무슨 능력으로 깨달음을 주겠소.”
“거짓말! 능력자면서! 나도 가르쳐줘요. 나도, 빨리.”
억지를 부리며 홍경을 마구 흔들어댔다.
그러다 홍경의 다리에 엎드려 구슬픈 목소리로 울먹였다.
“나도, 나도 강해지고 싶어요. 형부. 흑, 흐엉···.”
그 모습이 하도 처량해 다들 입을 열지 못했다.
함부로 위로도 할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이 친해질 수 있었던 건 셋 다 잘난 구석이 없어서였다.
무공은 변변찮고 문파 내부에서의 입지도 보잘것없으니,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향은 어느새 절정 고수가 돼버렸고, 숙희마저 고수의 길로 날아가 버렸으니 글미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못난이 세 자매에서 이제 혼자 남게 되었으니, 외롭고 또 두려워 홍경에게 억지를 부린 것이다.
“상공.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수향이 홍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간절한 얼굴로 부탁했다.
남편이라면, 성장의 가능성도 없는 늙은 사부를 궁극의 경지로 이끌어주었던 홍경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홍경은 잠시 고민했다.
마음만 먹으면 상대의 공력을 올려주는 건 일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방법과 명분이었다.
“흠···.”
자신의 다리에 엎드린 글미의 등을 쓰다듬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글미의 가장 큰 문제는 한쪽 다리를 잘 못 쓴다는 것.
만져보니, 그녀의 척추는 조금 삐뚤어져 있었는데, 이걸 바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았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자 글미가 벌떡 일어나 홍경을 끌어안고 소리쳤다.
“형부! 형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홍경은 그녀를 다독이며 떼어낸 후 말해다.
“진정하고 들어보시오. 내가 보기에 비 소저는 척추에 문제가 있소. 이걸 바로잡으면 불편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요. 다만···.”
“다만?”
“내가 소싯적에 특별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배운 적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요법이라 성공을 장담할 수 없소. 확률은 3할에 못 미칠 거요. 그래도 해보겠소?”
“할게요! 하겠어요!”
글미는 지금껏 자신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3할이든 1할이든,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다.
“좋소. 그렇다면 해봅시다. 두 사람이 도와줘야겠소.”
하인을 불러 정원을 치우게 하고 네 사람은 글미와 숙희의 별채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깔고 글미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커다란 나무망치와 나무로 만든 정을 꺼내 들었다.
“그, 그게 뭔가요오···.”
“이걸로 삐뚤어진 척추를 바로 잡을 거요. 두 사람은 비 소저가 움직이지 못하게 팔다리를 잡아주시오.”
사람 몸을 망치와 정으로 때려 바로 잡겠다니, 글미는 기겁했다.
이건 요법(療法)이 아니라 살법(殺法)이 아닌가!
“잠깐만요. 형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형부, 형부!”
“꽉 잡으시오.”
손으로 척추를 만져 확인한 후 정을 대고 망치로 쾅쾅, 두드렸다.
“끄악! 아파! 아파! 형부,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할래!”
“여보. 꽉 잡으라니까? 허 소저. 제대로 누르시오.”
글미는 어떻게든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두 사람의 고수가 압박하니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홍경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망치로 때려댔고, 글미는 그때마다 나 죽는다고 소리를 꽥꽥 질러댔다.
“아파. 형부 미워. 세상에서 제일 미워.”
“시끄럽소. 언제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이 잔혹한 고문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휴···. 이제 끝났소.”
“흑흑···.”
글미는 완전히 탈진해 이제 두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꼼짝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었다.
“고생 많았소.”
홍경이 위로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망치와 정은 사실 눈속임에 불과했고, 홍경은 글미의 등허리 부근 일부 근골을 환골탈태시켜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일어나 걸어보시오. 얼른!”
“흑흑···. 미워···.”
홍경의 재촉에 울면서 일어난 글미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음을 걸었다.
“괜찮아?”
“어?”
한쪽 다리를 절었던 게 언제였냐는 듯 이제 바르게 걸어졌다.
가만히 서도 무게 중심이 바로 잡혀 꼿꼿하게 설 수 있었다.
“형부! 됐어요! 저 이제 바로 걸을 수 있어요!”
“다행히 성공했군.”
“으앙, 형부!”
조금 전까진 원망의 말을 쏟아내던 글미는 홍경을 끌어안고 펑펑 울며 감사하고, 또 기뻐했다.
***
아침을 먹고, 글미와 숙희는 연무장에 섰다.
글미가 달라진 신체에 적응한다는 명목으로 숙희에게 비무를 신청했다.
그녀는 연무장을 엄청난 속도로 뛰어다녔다.
“아하하하하.”
이제껏 제대로 쓸 수 없었던 태을미리보를 극성으로 펼쳤다.
얼마나 빠른지 신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뒤늦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실력이 일취월장한 숙희였지만, 글미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한 번 공격하고 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니 초식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짜증이 난 숙희가 바닥에 목검을 내동댕이쳤다.
“못 해 먹겠네!”
***
주가장에서 보름간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두 사람.
“허 소저는 원래 가진 능력이 개화한 것이나, 비 소저는 온전히 내 덕이니 나에게 천 번, 만 번 감사해야 할 것이오.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때는 삼보일배를 하며 오시오.”
“형부에겐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올릴게요.”
홍경의 농담에 글미도 황제에게나 하는 예법을 취하겠다며 받아쳤다.
두 사람이 타고 갈 마차엔 비단을 비롯한 선물이 가득했다.
화산과 종남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제법 넉넉하게 챙겨 넣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홍경은 두 사람에게 대동단 한 알씩을 선물했다.
“이건 대동단이라는 영단이오.”
대동단의 효과를 설명해주자, 글미와 숙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형부. 너무 과해요.”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내 아내는 외로운 사람이요. 사문에 사형제 하나 없고···. 친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니 기쁘기 한량없소.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남아주시오.”
“언니와 우린 평생 갈 거예요.”
“고맙소. 두 사람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요. 언제든 사천으로 올 일이 있으면 꼭 주가장에 들러주시오.”
글미는 수향을 끌어안고 인사한 뒤, 홍경도 덥석 끌어안고 아쉬움을 표했다.
“형부···.”
글미가 포옹하는 모습에 숫기 없는 숙희도 주춤주춤 다가와 홍경을 어색하게 끌어안았다.
남자를 끌어안는 건 중원의 예가 아니지만,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마음을 드러낸 행위였다.
“다들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글미와 숙희를 태운 두 대의 마차가 주가장을 떠났다.
수향과 홍경은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서 지켜보았다.
- 작가의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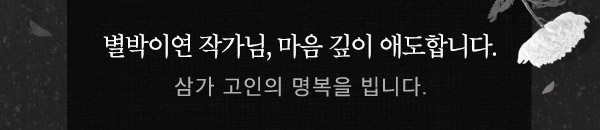



![뭐? 내가 망캐라고? [E] 뭐? 내가 망캐라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107/002/R8lpim7fDrcUhpdx.jpgtb.jpg)


![매직 코리아 [E] 매직 코리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630/001/NpLUGYgtE66JQdFm.jpgtb.jpg)
![에미르 [E] 에미르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109/003/rLiejOk3iuI1GR7x.jpgtb.jpg)
![천중용문(天中龍門) [E] 천중용문(天中龍門)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3/1113/004/Jf9wcyoUu89YwEwk.jpgtb.jpg)
![차원 추격자 : God of Dimension [E] 차원 추격자 : God of Dimension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1027/001/192KZzPN7O40O5dm.jpgtb.jpg)
![기원 [E] 기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1/003/7lGi5uhttXpE1KyD.jpgtb.jpg)
![환생천마 [E] 환생천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811/003/WumOfA2Xi4kdQgsM.jpgtb.jpg)
![혈기린외전 [E] 혈기린외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130/002/TCeYny2K2fIHSYOl.jpgtb.jpg)
![낙월진천 [E] 낙월진천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115/004/NErDqzVsj00yNweF.jpgtb.jpg)
![무림사계 [E] 무림사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112/003/5rdDo7SDXe1VqW5Y.jpgtb.jpg)
![전능의 팔찌 [E] 전능의 팔찌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227/000/oTMwURGMNj8j1ntD.jpgtb.jpg)
![F급부터 레벨업 [E] F급부터 레벨업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608/002/aCnnJhXAQ5d0t7Wc.jpgtb.jpg)
![삶의 미리보기 [E] 삶의 미리보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620/002/VWhqHONnuUhxxAM5.jpgtb.jpg)
![천하제일 [E] 천하제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208/000/awfcpckFeudjf6fl.jpgtb.jpg)
![비적유성탄 [E] 비적유성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415/003/OejXfxPzdnSRkG2f.jpgtb.jpg)
![쾌도무적 [E] 쾌도무적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5/0109/004/kjfBKOttj6M7wgzp.jpgtb.jpg)
![헌터신화 [E] 헌터신화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222/003/GllcSdVQecx50v8S.jpgtb.jpg)
![헬 블레이드 [E] 헬 블레이드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619/004/C93eYzjfTZ23ujbx.jpgtb.jpg)
![태양의 전설 바람의 노래 [E] 태양의 전설 바람의 노래 [E]의 표지](http://cdn1.munpia.com/tpl/novel/core/covers/heroism-05.jpgtb.jpg)
![다이너마이트 [E] 다이너마이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6/001/SSY4T1JLabQJO4U9.jpgtb.jpg)
![천봉(天峯) [E] 천봉(天峯) [E]의 표지](http://cdn1.munpia.com/tpl/novel/core/covers/heroism-02.jpgtb.jpg)
![新 대한제국실록 [E] 新 대한제국실록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116/003/eP20IelOXriwUGbg.jpgtb.jpg)
![[개정판] 절대군림 [E] [개정판] 절대군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4/83cEWLBuUh91wQMN.jpgtb.jpg)
![코트 위의 지배자 [E] 코트 위의 지배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430/000/3fGeiYK4kPOQ6MHx.jpgtb.jpg)
![장강 [E] 장강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523/004/YWazr0PDYrdmt1aw.jpgtb.jpg)
![금검경혼 [E] 금검경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0929/002/uEDMZAL4P7n6jau3.jpgtb.jpg)

Commen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