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보자기와 가마니.

# 06. 보자기와 가마니.
사천성 성도.
마을로 돌아온 홍경은 집으로 가기 전에 음식점부터 들렀다.
근 두 달여를 맛없는 영약만 먹고 지냈기에 기름기 도는 음식이 그리웠다.
성도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화월루로 향했다.
가게로 들어가자 근처에 있던 점소이가 달려와 인사했다.
“어서 옵쇼!”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차 빈자리가 없어 보였다.
“자리 있나?”
“2층에 한 자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쇼.”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부터 주문했다.
“우육면, 백주 한 병, 돼지와 쇠고기, 닭고기 요리 한 점씩 내주게.”
“예이. 우육면, 백주 한 병, 돼지, 소, 닭 요리 하나씩이요.”
“그래. 술부터 빨리 주게.”
“알겠습니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셔.”
작은 은 조각을 쥐여주자, 점소이는 기쁜 얼굴로 나는 듯이 달려갔다.
곧 점소이가 술과 우육면을 가져왔다.
받자마자, 국물부터 한 모금 들이켰다.
기름기 가득한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크어.”
오랜만에 맛보는 맵고 자극적인 맛에 혀가 춤을 추는 듯했다.
이거지.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후루룩, 후루룩, 열심히 젓가락을 놀려 면을 흡입했다.
잠시 후 점소이가 나머지 요리들을 가져와 식탁을 채웠다.
어향육사(魚香肉絲)와 철판우육(鐵板牛肉). 마지막으로 궁보계정(宮保鷄丁)이 나왔다.
혼자 먹기에 많은 양이지만, 홍경은 이보다 10배는 많아도 다 먹어 치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홍경이 한참 열심히 젓가락을 놀리던 그때, 아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자리가 없다니! 없으면 만들어야지!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엉?”
익숙한 목소리라 내려다보니, 역시 아는 인물이었다.
양가장의 장남인 양추.
양가장은 가장 큰 뽕밭을 가진 성도 제일의 지주라, 사천의 비단은 전부 양가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홍경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포목점의 비단도 전부 양가장에서 받아오는 물건이었다.
말하자면 갑, 을의 관계다.
집안 관계가 그렇다 보니, 양추는 옛날부터 홍경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질 나쁜 놈이었다.
양추 뒤에는 남자 하나, 여자 둘, 총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 경장(輕裝)에 검을 든 걸 보니 무림인으로 보였다.
그중 청색 무복을 입은 여인을 본 순간, 홍경의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쳤다.
‘세상에 저런 몸매가···.’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뒤로 탄탄하게 치솟은 엉덩이.
동양인이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얼굴은 또 귀염상이니 그야말로 베이글.
홍경은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홍경이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때, 자리를 내놓으라며 씩씩거리던 양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2층의 홍경을 발견했다.
양추는 이제 됐다는 듯, 씨익 웃으며 뒤쪽의 사내에게 말했다.
“형님. 마침 자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나 다를까, 양추는 세 사람을 데리고 홍경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이봐. 홍경이.”
이름은 귀한 것이라 부모나 스승, 군주 외에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보통 자(字)나 직책, 무림인이라면 별호를 부르는 게 상례다.
직접 이름을 부른 것만 봐도 양추가 얼마나 홍경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 이분들은 당문의 당소저, 무림맹의 육소저시네. 이분은 내 팔촌 형님이신 청성의 양대협이시고. 오늘 이 귀한 분들을 대접하려 힘들게 화월루로 모시고 왔는데, 하필 자리가 없어 곤란하던 참이었네. 자네가 자리를 양보해줘야겠어. 뭐하나! 냉큼 일어나지 않고.”
합석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내놓으란다.
아직 손도 안 댄 음식이 있는 걸 보고도 말이다.
홍경은 못 들은 척, 계속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잔에 술도 따라 마셨다.
“이, 이 자식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제 말을 듣지 않자 당황한 양추는 홍경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으악!”
양추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홍경이 양추의 불알을 덥석 움켜잡아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음식을 먹었다.
“놔, 놔라. 이놈! 아으, 아읏!”
비명을 지르다 못해 입에 거품을 물 지경이 되자, 팔촌 형이라는 사내가 나섰다.
“이보시오. 형장. 본인은 청성의 청우자(淸羽子) 양가기라고 하오. 남들 보는 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울 것까진 없지 않소. 내 얼굴을 봐서 이만 놔주시오.”
정중하게 말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걸 보면 ‘감히 네가 청성파의 이름을 듣고도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그때 귓속으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자. 청성의 양가기는 속이 좁고 편협해 사소한 원한도 잊지 않는 자에요. 지금 상황이 기분 나쁘겠지만, 물러나도록 하세요. 저는 무림맹 사천지부의 육소향이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사과하고 음식값도 갚아드릴게요.’
육소향이 전음으로 경고해왔다.
‘몸매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곱네.’
참으로 마음에 드는 처자다.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다.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양추의 불알의 놓아준 후, 일어서 양가기에게 공수하며 말했다.
“아, 청성파의 양 대협이셨군요. 이 주모가 어찌 양 대협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하. 먼저 일어날 테니, 여기서 식사들 하시지요.”
나가면서 바닥에 쓰러진 양추를 질근질근 밟고 지나갔다.
“아악!”
“아이코, 길이 좁아 밟고 말았네. 그럼 이만···.”
순간 양가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양추를 일부러 밟고 간 건 자신을 무시한 처사나 마찬가지였다.
홍경은 따가운 눈빛을 받으며 후다닥, 계단을 내려갔다.
가게를 나온 홍경은 또 집으로 가지 않고 사거리를 지나 엉뚱한 곳으로 걸어갔다.
홍경이 멈춰선 곳은 윤선당(潤善堂)이라는 이름의 약방 앞이었다.
약방 입구엔 약(藥)이라고 쓰인 깃발이 걸려 있었고, 문 옆에는 조전비방(祖傳秘方 조상에게서 대대로 전해진 비법)이라는 초패(招牌)가 붙어 있었다.
어느 약방을 가도 붙어 있는 흔한 광고 문구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짙은 약초 냄새가 훅하고 풍겨왔다.
“이숙!”
홍경이 부른 소리에 안쪽에서 유건을 쓴 하얗고 짙은 눈썹의 노인이 걸어 나왔다.
노인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뭐하러 온 게냐.”
“이숙. 손님이 왔는데, 반겨주기는커녕 뭐하러 왔냐뇨.”
“사지 멀쩡한 놈이 왔는데, 뭐가 손님이냐. 비실비실한 놈이 와야 오늘 은자 좀 만지겠다 하는 거지. 벼락을 맞고도 멀쩡한 놈이 잔병치레라도 하겠냐?”
노인은 약방의 주인인 이춘관이었다.
어릴 때 몸이 약했던 홍경은 늘 윤선당에서 보약을 지어 먹었다.
오랜 인연으로 홍경은 이춘관을 숙부(叔父)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
벼락을 맞았을 때 달려온 의원도 이춘관이었다.
이춘관은 서랍에서 작은 자기 병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온김에 이거나 가져가. 흉터를 지우는 데 도움이 될 게다.”
벼락을 맞고 생긴 흉터에 바르라고 약을 준 것이다.
말도 안 했는데, 바로 꺼내는 걸 보면 미리 준비해둔 물건이 틀림없었다.
고마운 양반이다.
“그런데 그동안 뭘 처먹고 다닌 게냐. 때깔이 왜 이리 좋아졌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라니?”
“이숙, 혹시 한몫 잡아볼 생각 없으세요?”
“뭐? 한몫?”
“최근에 귀한 약초를 구해서요. 제 때깔이 좋아진 것도 이것 덕분이죠. 약초를 사갈 만한 사람 좀 연결해 주세요. 이숙 인맥이면 비싼 약초를 거래할 사람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성사되면 물건값의 1푼을 소개비로 드릴게요.”
“뭐냐. 도대체 어떤 약초길래. 지금 가지고 있느냐?”
행낭에서 슬쩍 천년설삼이 든 목함(木函)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뚜껑을 열자, 함에서 흘러나온 맑고 짙은 향기가 순식간에 약방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이, 이, 이, 이건!”
한눈에 물건의 정체를 알아본 이춘관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설삼입니다. 천년 정도는 묵은 놈 같은데···. 어떠세요?”
흥분해 호흡이 가빠진 이춘관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더니,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삼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향 하나가 다 탈 시간이 지나서야 이춘관은 결론을 내렸다.
“이건 천년설삼이 분명하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사천에선 설삼이 자라지 못해. 그런데 이건 마치··· 방금 캐낸 것처럼 생생해. 도대체···.”
“비밀입니다. 이숙.”
“너 정말 이러기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것보다 지금은 이걸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얼마에 팔 생각인데?”
“200만 냥요.”
“뭣? 이, 이백? 이배액? 이배애애애액 마아아안? 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느냐?”
이춘관이 소리를 빽 질렀다.
성도 최고 갑부라는 양가장의 재산을 다 처분해도 200만 냥은 안 될 것이다.
도대체 그런 금액을 누가 지불할 수 있단 말인가.
홍경은 흥분한 이춘관을 달래듯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숙, 생각해보세요. 천년설삼이라는 게 소설책에나 나오는 거지, 역사상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 있습니까?”
“으음···.”
“이런 물건은 구하고 싶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게 곧 값인 거죠.”
“흐음···.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그래도 너무 과하다. 얼마 전에 500년 묵은 하수오가 20만 냥에 거래됐다고 하더구나. 약성에 차이가 크긴 하다만, 100만 냥이면 몰라도 200만 냥은···.”
“그럼 100만 냥 하죠. 뭐.”
“······.”
“처음에 200만을 불러도 진짜 살 마음이 있으면 흥정이 오갈 테고, 그러다 보면 100만 냥까지 내려가지 않겠어요. 반값이라 생각하면 그쪽도 만족하겠지요.”
이춘관이 홍경을 노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흥···. 누가 장사꾼 아들내미 아니랄까 봐.”
“하하. 아무튼, 그래서 연결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고민하던 이춘관이 골치가 아프다는 듯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옛날에 서문세가의 부총관과 연을 맺은 적이 있다. 일단 그쪽에 연락해 보마.”
“서문세가 정도라면 확실히 관심을 보이겠군요.”
“너무 기대하진 말고.”
“예. 이숙.”
홍경이 나가자, 이춘관이 입구까지 나와 배웅했다.
***
그 시각, 홍경이 지나쳤던 사거리에 양가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작 포목점 아들 따위가 자신을 무시하다니, 도저히 이번 일을 참고 넘길 수 없었다.
양가기는 뒷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와 혼자 주변을 뒤지고 있었다.
찾아서 제대로 밟아줄 생각으로 씩씩거리며 돌아다니다, 결국 홍경을 찾아내고 말았다.
홍경은 약방 앞에서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양가기는 두 사람이 헤어지면 바로 골목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며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중에 귀가 번쩍 뜨이는 단어가 들려왔다.
‘처, 천년설삼?’
“꼭 서문세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천년설삼이라면 무림 문파 중에 누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 중에 살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런 게야. 혹시 틀어지면, 서문세가에 중개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지.”
“그것도 좋겠네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숙.”
“일이 진행되면 연락하마. 보관이나 잘해둬.”
“네. 이숙.”
이춘관이 약방으로 돌아가자, 양가기는 골목에서 나와 홍경의 뒤에 따라붙었다.
작업하기 적당한 좁은 골목이 보이자, 양가기는 홍경을 불러 세웠다.
“주 형!”
“양 대협 아니십니까. 벌써 식사를 마치셨나 보군요.”
“맞소. 배를 꺼뜨리려고 잠깐 산책 중에 주 형을 보고 달려왔소. 아까 내 동생 놈이 무례를 범했는데, 그때 사과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말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육수향의 경고도 있었지만, 한번 대면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놈은 절대 남에게 사과할 성격이 아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싶어 멈춰서 기다려주었다.
“그런데 말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아까 의원이랑 이야기를 나눈 걸 들어버렸지 뭐요. 혹시 주 형이 진짜 천년설삼을 가지고 있소?”
아니나 다를까.
진심은 딴 데 있었다.
“네.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지요. 적당한 가격에 팔려고 합니다. 왜요.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소. 우리 청성파에 파시오. 가격은 잘 쳐주리다.”
“호오···. 얼마에 사갈 생각이십니까?”
잠깐 고민하는 척하더니, 당당하게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1만 냥 어떻소?”
어이가 없어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왜 그러시오.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하오만.”
“제 생각과는 너무 차이가 크군요. 거래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경이 돌아서자, 양가기가 다급하게 어깨를 붙잡았다.
“이보시오. 주 형. 그냥 1만 냥이 아니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우리 청성파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오. 앞으로 청성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오. 성도, 아니 사천 안에선 누구도 주 형 가문을 건드릴 수 없을 거요. 이 정도면 100만 냥의 값어치가 있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이건 거래가 아니라 호의나 다름없소!”
뻔뻔한 이야기에 헛웃음만 나왔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어깨를 붙잡은 손을 밀어내고 다시 돌아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인적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자, 쫓아 온 양가기가 본색을 드러냈다.
“감히 우리 청성파를 무시하는 건가? 상인 나부랭이 집안의 떨거지 따위가?”
칭!
엄지로 검을 밀어 올리는 소리에 홍경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말로 안 되니 검을 빼 든다.
이런 게 무슨 명문 정파의 제자란 말인가.
“이 새끼가 진짜···.”
“뭐? 새, 새, 새끼라고?”
황당한 얼굴로 반문하던 양가기는 금세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설마 무공도 모르는 놈한테 새끼 소리를 들을 줄이야.
팔 한쪽은 베어버릴 생각에 검을 빼 들려는 찰나.
철썩!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니, 뒤로 훌쩍 날아가 쾅 하고, 벽에 부딪혔다.
뒤통수를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뇌진탕이 일어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이, 이, 개자식이···.”
철썩!
또 한 번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불꽃 같은 잔상이 빙글거리고, 눈앞의 사물이 두세 개씩 겹쳐 보였다.
양가기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홍경은 양가기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턱을 붙잡아 흔들며 물었다.
“야, 보자 보자 하니까 사람이 보자기로 보이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마니로 보여?”
홍경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자, 양가기는 새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히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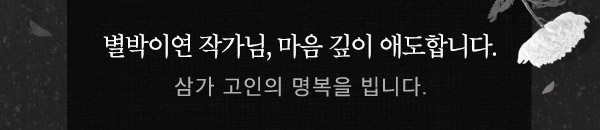



![뭐? 내가 망캐라고? [E] 뭐? 내가 망캐라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107/002/R8lpim7fDrcUhpdx.jpgtb.jpg)


![군림천하 [E] 군림천하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829/001/KQ9eJGf756qtWcqz.jpgtb.jpg)
![비뢰천신 [E] 비뢰천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627/000/8FQkWX2Gq8cJrRQk.jpgtb.jpg)
![메카닉군주 [E] 메카닉군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212/000/b34TOghmD6HQig63.jpgtb.jpg)
![[개정판] 절대마신 [E] [개정판] 절대마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2/7GO7x7xvU9YZCc7m.jpgtb.jpg)
![올라운드 플레이어 [E] 올라운드 플레이어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720/002/f1YoLV8iTZHh5WCI.jpgtb.jpg)
![마왕의 게임 [E] 마왕의 게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1/004/kiDu34bb4ZKXn810.jpgtb.jpg)
![[개정판] 절대강호 [E] [개정판] 절대강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0/L21c6WTac8xjIMV9.jpgtb.jpg)
![재벌강점기 [E] 재벌강점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508/004/aIBJ9u9YXsD5eLZy.jpgtb.jpg)
![너의 진심이 들려 [E] 너의 진심이 들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017/004/MfrJw8zTYtGQNV5T.jpgtb.jpg)
![화산검신 [E] 화산검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1010/004/YOTWh159FwUf0UEU.jpgtb.jpg)
![마졸 귀환록 [E] 마졸 귀환록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1219/003/HIQPmnD6ugBQA5W3.jpgtb.jpg)
![골든 메이지 [E] 골든 메이지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814/002/eKq3iVnJJSqfs7PE.jpgtb.jpg)
![비천신마 [E] 비천신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018/004/OxvDW9Q2xU9Ngnez.jpgtb.jpg)
![화선무적 [E] 화선무적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5/003/DxpbuMr1ZqzYSvZ7.jpgtb.jpg)
![무림사계 [E] 무림사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112/003/5rdDo7SDXe1VqW5Y.jpgtb.jpg)
![사마쌍협 [E] 사마쌍협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0805/001/CsVJswNcBIm4HOc3.jpgtb.jpg)
![독불장군 신권철 [E] 독불장군 신권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425/001/FwtXQVHAyg7d6fBo.jpgtb.jpg)
![혈기린외전 [E] 혈기린외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130/002/TCeYny2K2fIHSYOl.jpgtb.jpg)
![연금술사의 항해일지 [E] 연금술사의 항해일지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907/002/uDsLMDOt7lVAUARK.jpgtb.jpg)
![독보건곤 [E] 독보건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1230/001/K266QoQC0CuF9nY8.jpgtb.jpg)
![백염의 심판자 [E] 백염의 심판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610/002/G3758NGcmElZg9By.jpgtb.jpg)
![금검경혼 [E] 금검경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0929/002/uEDMZAL4P7n6jau3.jpgtb.jpg)
![천의 허지훈 [E] 천의 허지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322/003/k1gJCHcpdqc5Rc78.jpgtb.jpg)
![환생행 [E] 환생행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118/000/WVrY36pmwK8hVp7X.jpgtb.jpg)
![정령으로 요리왕 [E] 정령으로 요리왕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709/004/9JwQac5CrPrl2NWh.jpgtb.jpg)

Commen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