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형부는 허풍쟁이

# 49. 형부는 허풍쟁이.
무림맹.
오지고는 책상에 앉아 홍경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정도면 토지문서를 돌려받을 수 있겠지?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문득 홍경을 만난 그날의 경험이 떠올랐다.
‘그 위압감은 도대체···.’
무공과는 결이 달랐다.
천하의 고수들을 두루 만나봤지만, 한 번도 그런 위압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심지어 인간이 아닌 마신이 강림한 것 같던 혈마조차도 그랬다.
어쩌면 황제라면, 천하를 지배하는 천자라면 그런 위압감을 풍기지 않을까 하는, 불경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하가 다급한 목소리로 뭔가 일이 벌어졌음을 알렸다.
“총관 어른. 큰일 났습니다!”
“뭐? 또 큰일?”
홍경에게 하도 호되게 당해 새가슴이 된 오지고는 큰일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났다.
“무, 무, 무슨 일이야!”
“황 장로가 검을 들고 봉황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뭬야!”
백호단주와 사천지부장의 목이 날아간 게 벌써 소문이 났는데, 그게 황과로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다.
제자의 목이 날아간 걸 알게 된 장로 황과로는 차마 오지고에게는 따지지 못하고, 만만한 엄복동을 찾아간 것이었다.
“진짜 큰일이구나!”
엄 장로의 실력은 황 장로보다 확연하게 한 수 아래.
엄 장로가 다치기라도 하면 홍경이 가만있을 리가 없었다.
‘아직 땅문서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오지고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엄 장로의 처소인 봉황각으로 달려갔다.
오지고가 봉황각에 도착했을 땐 황 장로가 검을 뽑아 들고 엄복동을 위협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앞길이 창창한 내 제자를 고발해 그 지경을 만들어? 네놈이 무슨 자격으로!”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
“죄? 죄라고? 옳은 말을 한 게 죄냐? 네놈 제자가 은자에 팔려 간 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 그래. 어디 나도 한 번 고발해 봐라!”
황 장로가 자꾸 귀찮게 엉겨 붙자, 엄복동은 혀를 차며 손을 저었다.
“적당히 하고 물러가게.”
“적당히? 적당히는 네놈 모가지를 날리는 게 적당히 다!”
황 장로가 기어코 검을 휘둘렀다.
검기를 두르고 전심전력으로 휘두르는 게 진심으로 벨 작정이었다.
“안 돼!”
다급히 소리치며 오지고가 달려들려는 그때, 엄복동이 출수했다.
쾅!
검이 맞부딪히는 순간, 빛이 번쩍 하더니 황 장로는 저 멀리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혀버렸다.
“쿨럭···.”
황 장로는 부서진 담벼락 사이에 박혀 꼴사나운 모습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지고는 경악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 장로의 공격을 막아낸 그때 터져 나오던 일곱 빛깔의 강기(罡氣).
“칠채검결···.”
오지고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저 문파마다 하나씩 있는 전설이라 여겨졌던 그것이 현실로 넘어온 순간을 목도한 것이다.
오지고는 황 장로의 상태 따윈 신경 쓰지도 않고, 엄복동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엄 장로! 사문의 무공을 되찾으셨구려. 축하드리오.”
“고맙소.”
엄복동이 담담하게 답했다.
그의 작은 미소에 오지고는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찾았다. 이 사람이었어!’
무림맹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이제 접어둬도 될 듯했다.
모두가 바라던 인재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진작 엄 장로의 실력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탓했다.
그랬다면 홍경에게 그런 수모를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엄 장로. 맹주님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맹주님을?”
엄복동의 눈에 의아한 빛이 서렸다.
벌써 일 년 가까이 칩거에 들어간 맹주를 만나보라고?
***
광무 26년 4월 초.
봄바람과 함께 사천지부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육 언니!”
“희야. 미미!”
수향의 지인인 화산파의 허숙희(許淑希)와 종남파의 비글미(丕契美)였다.
허숙희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피부가 하얬는데, 무표정한 얼굴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별명이 백강시(白殭屍)였다.
그녀는 융통성이 없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사람을 잘 사귀질 못했다.
비글미는 키가 작고 앳된 얼굴에 눈매가 아래로 처져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어릴 때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절었는데, 그 때문에 구대 문파의 하나인 종남의 제자치고는 무공 실력이 별로였다.
겉으로는 쾌활하고 수다스러웠지만, 장애 때문인지 모르는 사람에겐 낯을 많이 가려 그녀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수향과 친해진 것도 두 사람이 비주류였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은 무림맹 훈련소 동기였는데, 두 사람 외엔 쫄딱 망한 문파의 제자인 수향을 가까이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혼례식 때 못 가서 미안해. 언니.”
“아냐. 아냐. 괜찮아. 지금 이렇게 나 보러 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걸.”
일대 제자로 막내급인 둘은 아직 마음대로 하산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니 나가자. 너희 형부 소개해 줄게. 지금 가게에 있을 거야.”
“좋아. 언니.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수향은 두 사람을 데리고 주가반점으로 갔다.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오.”
원래 바쁜 점심시간엔 일부러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 가게로 왔을까, 하며 홍경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반가움을 표했다.
남편의 애정표현에 당황한 수향은 가슴을 밀어내며 숙희와 글미를 소개했다.
“훈련소 시절 동기였던 화산의 허숙희와 종남의 비글미예요.”
“허 소저, 비 소저.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형부! 정말 화끈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글미는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수향을 끌어안은 홍경을 보며 눈을 반짝거린 반면, 숙희는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탐색하듯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다.
“여긴 음식도 변변찮아서 대접하기가 그런데, 두 사람을 데리고 저기 금화루로 가시오.”
“금화루면 금가전장의 금 장주가 새로 개업한 곳 말인가요?”
“맞소. 엊그제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녀오셨는데, 아주 괜찮았다고 만족해하시더군. 이걸 가져가시오.”
홍경은 손가락 두 개 크기의 황금색 패를 건네주었다.
금가전장에서 일부 인사에게만 발행한 특별한 신분 패였다.
이것만 있으면 금가전장과 계약한 모든 가게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면 손님들을 우리 장원에 데려가 별채를 내주시오. 당신 손님이니 제일 좋은 곳을 내줘야겠군.”
“후후. 그럴게요.”
“나중에 봅시다.”
수향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가게를 나왔다.
내색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은 주가반점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다.
부잣집에 시집갔다더니, 막상 수향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다.
시집을 가서도 그녀가 계속 무림맹에서 일하는 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금화루로 가는 길.
지나치던 사람들이 수향을 알아보고 너도나도 인사를 해왔다.
“육 부인!”
“안녕하세요. 육 부인.”
“육 부인! 이것 좀 들고 가세요.”
수향은 일일이 상냥하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언니. 다들 아는 사람들이야?”
수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니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가문에서 큰 뽕밭을 가지고 있거든. 사천 비단은 전부 주가장의 창고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 꽤 규모가 크지.”
“와-. 그랬구나. 그럼 형부가 하는 가게는 뭐야.”
“취미? 나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걸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
“세상에···.”
알고 보니 홍경의 집안은 상당한 부자였다.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 인사하는 걸 보면 평판도 나쁘지 않은 듯했다.
사람들이 수향을 무림인이 아닌 주가장의 육 부인으로 대하는 게 신선했다.
금화루에 도착한 세 사람.
가게로 들어가려는 데 입구에서 문지기의 제지를 받았다.
“예약하셨습니까?”
원래 예약제로 운영하는 가게였던 모양이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수향은 문득 홍경에게서 받은 황금패가 생각나 그걸 보여주었다.
황금패를 본 문지기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공수하며 사과했다.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후 지배인이 달려 나와 수향을 향해 양손을 맞대며 정중히 인사했다.
“육 부인께서 오셨군요! 몰라뵈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놈! 부인께 사과는 드렸느냐!”
지배인이 문지기에게 야단을 치자 수향이 황급히 만류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예약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와서 그래요.”
“성도에서 주가장의 분들을 몰라보는 건 예의가 아닙지요. 다음엔 올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마차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올라오십시오.”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지배인을 보며 숙희와 글미는 서로의 귀에 속삭였다.
“사천은 당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가장이 더 대단한 모양이야.”
“당가는 폐쇄적이라서 무림인이 아니면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가?”
지배인은 세 사람을 5층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비들이 좌우로 나란히 서서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주방장도 직접 나와 인사를 올렸다.
“주방을 맡은 강 모라고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창가 맞은 편엔 다섯 명의 악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연주를 시작했다.
악대가 곡을 연주하는 사이 시비들이 음식을 날라왔다.
생전 처음 보는 색색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탁자를 빼곡히 채워 세 사람의 눈을 커다랗게 만들었다.
“언니. 맨날 이렇게 먹어?”
“아냐. 나도 이런 건 처음이야.”
시비가 커다란 생선찜이 담긴 쟁반을 가져와 생선의 머리를 수향 쪽으로 향하게 내려놓았다.
보통 생선요리는 자리한 손님 중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 쪽으로 머리가 향하게 놓는 게 원칙이었다.
이때 상석에 앉은 손님은 ‘어두주(語頭酒)’라 하여 먼저 한 잔을 비워야 한다.
수향이 잔을 비우자, 뒤에 선 시비들이 모두의 잔에 술을 채웠다.
“자, 첫 잔은 건배(乾杯 잔을 완전히 비운다는 뜻).”
잔을 비우면 뒤에 선 시비들이 바로 술을 따라 잔을 채워 놓았다.
음식들은 맛있었고, 대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아 세 사람은 아주 만족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수향에게 인사를 하러 금화루의 주인인 금융인이 직접 오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수향을 만나러 오기 전까진 주가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 주가장은 어떤 곳이길래, 돈 많은 전장의 주인까지 굽실거리며 눈치를 보는 걸까.
두 사람의 궁금증이 커졌다.
***
주가장.
수향의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두 사람이 지낼 별채로 안내를 받았다.
작은 정원이 딸린 소담한 건물이었는데, 내부는 정갈하고 깔끔해 마음에 쏙 드는 곳이었다.
보통 부자들은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가구로 재력을 과시하는 법인데, 주가장은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
주가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일면이었다.
저녁이 될 무렵 홍경이 돌아왔다.
홍경은 두 사람을 초대해 같이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엔 다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네 사람 중 세 사람이 무림인이다 보니, 이야기는 대부분 강호에 대한 소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갑자기 글미가 물었다.
“형부는 왜 무공을 익히지 않나요?”
홍경이 대답을 고르는 듯, 턱을 매만지다 이내 답했다.
“이 나이에 높은 경지에 오르라는 말은 아닐 테고, 호신의 의미라면 굳이 배울 필요를 못 느껴서라고 답하겠소.”
“어째서요?”
“내가 이래 봬도 주먹엔 제법 자신이 있거든.”
홍경이 주먹을 흔들어 보이자, 글미가 입을 가리고 웃어댔다.
“아하핫, 그래요?”
명문 대파의 제자인 그녀들이 보기엔 홍경이 주먹 자랑이 가소롭게 느껴지는 게 당연했다.
“고수라 자칭하는 친구들을 제법 만나봤는데, 다 나한테 두들겨 맞고 엉금엉금 기어나갔지.”
“에이, 형부가 진짜 고수를 못 만나봐서 그런 거죠.”
“진짜 고수라. 어떤 자를 진짜 고수라 하오?”
홍경의 질문에 글미는 질문으로 답했다.
“그럼 형부가 싸워 본 최고수는 누군데요?”
“화신교의 긍 교주. 긍 형님이오. 그 양반 제자들이 내 가게에 와서 말썽을 부리길래 화신교로 따지러 갔지. 만나자마자 서로 주먹질 좀 하다가 뜻이 맞아 의형제가 되었소.”
글미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고, 숙희도 웃음을 참지 못해 피식거렸다.
“아하하, 형부는 허풍이 세네요.”
진실을 말해도 믿질 않자, 홍경도 허풍이라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사실 이 사람도 내 허풍에 속아서 시집왔다고.”
“그래요? 못 됐다. 형부. 언니를 속여서 잡아채다니.”
“그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소. 미안하오. 부인.”
수향이 홍경의 어깨를 때리며 타박했다.
“그러지 말아요. 다들 진짜로 믿는다고요.”
평소 낯을 가리는 두 사람도 수향의 남편이라 그런지 금세 마음을 열고 홍경을 스스럼없이 대했다.
“형부, 형부. 우리 사천 관광 좀 시켜주세요.”
“혹시 가보고 싶은 데가 있소?”
글미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두보초당(杜甫草堂)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두보초당은 당대의 시인 두보가 잠시 살던 곳으로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서문(西門) 외곽에 있었다.
“초당 뒤편에 대숲이 있는데, 정취가 남다르거든. 거기서 두보가 즐겼던 검남춘도 한잔하고 놀다 옵시다.”
글미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좋아요! 좋아요! 너도 좋지?”
숙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
다음 날.
마차를 몰고 두보초당으로 향한 네 사람.
마차를 세워두고 홍경은 안줏거리를 사러 혼자 자리를 떴다.
“금방 갔다 올 테니,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시오. 못 참겠으면 먼저 마시고 있어도 괜찮소.”
“참을 수 있어요. 형부!”
“비 소저는 허풍이 세군.”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진짜 한 모금도 안 마신다면 나중에 선물을 주겠소.”
“진짜죠?”
“이 형부를 못 믿나보네?”
“음. 형부는 허풍쟁이지만, 한 번 믿어볼게요.”
홍경이 떠나고 세 사람은 두보초당을 잠깐 둘러본 후 근처의 대숲으로 이동했다.
적당한 공간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다.
바람이 대숲을 지나며 시원한 소리를 내자,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정취가 느껴졌다.
글미가 못 참겠다는 듯 술병의 마개를 땄다.
“미아. 너···.”
“헤헤···. 형부한텐 모른 척해줘.”
“안 돼···.”
그때 대숲 속에서 한 사내가 엎드린 채로 세 사람을 훔쳐보고 있었다.
“화산에 종남, 무림맹까지. 날 잡으러 온 건가!”
세 사람의 복장과 검을 보고, 한눈에 정체를 파악한 것이다.
세 사람의 조합을 보고 긴장했지만, 곧 단지 놀러 온 것뿐이라는 걸 알아챘다.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지는 않을 테니까.
사내의 정체는 적안색마(赤顔色魔), 응희라는 유명한 음적으로 무림맹의 수배와 현상금이 걸리자, 남들의 이목을 피해 이 대숲에서 숨어 산 지 벌써 1년째였다.
여자 맛을 못 본 지 오래라 세 여인을 보니 음심이 동했다.
‘셋 다 애송이로군.’
자신의 실력이면 세 사람을 다 제압할 수 있겠다고 판단 내렸다.
‘오랜만에 욕구를 풀 수 있겠어.’
군침을 삼키며 응휘는 낮은 자세로 천천히 세 사람을 향해 다가갔다.
- 작가의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한 편 올리겠다고 했지만, 스스로를 과신했습니다.
밤새 글을 쓰다 아침에 너무 졸려 잠깐만 눈을 붙이려 했는데, 눈을 뜨니 저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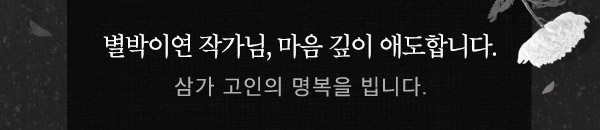



![뭐? 내가 망캐라고? [E] 뭐? 내가 망캐라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107/002/R8lpim7fDrcUhpdx.jpgtb.jpg)


![통일 코리아 제국 [E] 통일 코리아 제국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329/002/MrArUYyRCp8YWuyU.jpgtb.jpg)
![무림사계 [E] 무림사계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112/003/5rdDo7SDXe1VqW5Y.jpgtb.jpg)
![종천지애 [E] 종천지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1/001/rannVAWsXrOuJqiy.jpgtb.jpg)
![무당소사숙 [E] 무당소사숙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826/002/KzN6oNiRiNBISFxZ.jpgtb.jpg)
![회귀행 [E] 회귀행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2/000/BEkP4FZPxCFraC2L.jpgtb.jpg)
![타임홀릭 [E] 타임홀릭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427/004/LZpHebvSbHgRO4MU.jpgtb.jpg)
![재벌강점기 [E] 재벌강점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508/004/aIBJ9u9YXsD5eLZy.jpgtb.jpg)
![역천의 발뭉 [E] 역천의 발뭉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613/001/lacQ9Rdf3qbLk2Bu.jpgtb.jpg)
![속가제자 [E] 속가제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613/001/FEm4vYrhDH14b0iQ.jpgtb.jpg)
![이것이 법이다 [E] 이것이 법이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01/000/JGScEFjfjuEfTcgc.jpgtb.jpg)
![앱설루트 [E] 앱설루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403/001/mYrMrukaLbQInLSo.jpgtb.jpg)
![다 쓸어버린다 [E] 다 쓸어버린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627/003/52U32sj7mhrpTIxB.jpgtb.jpg)
![환생천마 [E] 환생천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811/003/WumOfA2Xi4kdQgsM.jpgtb.jpg)
![책을 읽으면 경험이 쌓여! [E] 책을 읽으면 경험이 쌓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824/001/GZZIbmD0Wku7aKx2.jpgtb.jpg)
![척안의 마도사 [E] 척안의 마도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8/001/o4s9pDChKGlt0zTE.jpgtb.jpg)
![[개정판] 절대강호 [E] [개정판] 절대강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0/L21c6WTac8xjIMV9.jpgtb.jpg)
![돈 버는 스케일이 계속 커져! [E] 돈 버는 스케일이 계속 커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0614/001/eS6Cd8wo16nwHHOp.jpgtb.jpg)
![화산검신 [E] 화산검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1010/004/YOTWh159FwUf0UEU.jpgtb.jpg)
![천룡전기 [E] 천룡전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418/003/Dll8prfKLlMtcFFN.jpgtb.jpg)
![다이너마이트 [E] 다이너마이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6/001/SSY4T1JLabQJO4U9.jpgtb.jpg)
![재벌집 둘째 딸 [E] 재벌집 둘째 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1016/004/LvLoJbQfIaPkuuux.jpgtb.jpg)
![최강신화 [E] 최강신화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7/001/hM9A3o1dNwI5Un04.jpgtb.jpg)
![재벌 야망 [E] 재벌 야망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1120/004/CdoA7buIIan0CHjg.jpgtb.jpg)
![귀환 마도사 [E] 귀환 마도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407/004/25cXbI0JnL1kdjyV.jpgtb.jpg)
![에틸렌의 소공자 [E] 에틸렌의 소공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919/003/560Htj90vi7KZFhO.jpgtb.jpg)

Commen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