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당연 다시 한번 별상칼의 문양에 대고 손가락을 죽 그어 보았다.
그러나 별상칼이 다시 예기를 띄지는 않았다.
‘흠, 이런 경우 소설 같은 데서 보면 무의식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곤 하던데.’
그렇지만 무의식 상태로 경험한 일을 의식한 채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일단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제는 짐도 가볍다.
남은 거라곤 음식물과 이리저리 찢어진 텐트뿐이다.
그것들 모두를 배낭 하나에 우겨넣으니 가져가야 할 짐은 단출하다.
문제는 내 키가 넘도록 쌓인 눈이다.
일단 시간이 늦어 내일 출발하기로 하고 모닥불가에 앉아 남은 음식을 먹으며 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텐트도 없고 몸을 누일 침낭도 없지만 걱정은 되지 않는다.
빗자루로 만들었던 싸리를 가져와 이리저리 꼬아 설피를 만들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새벽녘 설핏 졸다가 희끄무레 동이 터오자 설피를 신고 길을 나섰다.
장터목 방향이 아니다.
법계사가 있는 방향이다.
물론 중산리로 내려가면 다시 백무동까지 이동을 해야 한다.
차가 없다면 아마 온종일 길에서 보내야 할 거다.
그렇지만 장터목까지 갔다 다시 백무동계곡을 내려가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지금과 같이 눈이 쌓였다면 더욱 더.
더구나 천왕봉에서 장터목까지 가는 시간이면 법계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로타리 대피소가 있다.
거기에 부지런한 스님들이 산에 오르는 등산객과 보살들을 위해 법계사까지는 눈을 치워뒀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
‘흠, 여기까지는 눈을 안 치웠군.’
얼마간 내려가다 보면 법계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눈이 치워져 있을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눈을 치운 흔적이 없다.
아무래도 법계사 스님들이 게을러진 모양이다.
장터목으로 가는 길과는 달리 중산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다.
조금만 삐끗하면 구를 수도 있다.
그런 길을 가는데도 힘들고 지친다는 느낌이 없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다지만 허기가 좀 질 뿐 눈길에 지치지 않는다.
기분은 좋지만 좀 의아하다.
내가 내 체력을 아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체력이 는 건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조심조심 눈길을 내려오길 2시간 남짓.
저 멀리 법계사 3층석탑 상륜부에 있는 포탄 모양의 석물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법계사 주변인데도 정말 눈을 치운 흔적이 없다.
다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쌓인 눈이 준다는 점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
아마 천왕봉에서만큼 눈이 오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법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계사 일주문을 오르는 계단에도 눈이 쌓여 있는 것이다.
물론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산문이 아닌가.
아무리 게으른 스님이라도 절의 일주문을 오르는 계단에 눈이 쌓여 있도록 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눈 위로 사람 발자국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많아야 두세 사람 발자국이다.
드나드는 보살님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숫자 아닌가.
“뭐야, 산문이 문이라도 닫았나?”
법계사에 올라 절밥이라도 얻어먹고 가려던 생각을 지우고 바로 아래 로타리 대피소로 향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스산한 분위기.
대피소를 오르는 나무 계단은 망가져 있고 난간 역시 한쪽으로 쓰러진 상태다.
그리고 부서진 계단 아래 아직 채 치우지 못한 눈 위에 있는 마치 핏자국처럼 보이는 흔적.
‘뭐야? 살인사건이라도 벌어진 건가?’
“안에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가 집이자 직장인 대피소 사장이 어디 가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에 일단 목소리를 키워봤다.
더구나 뭔가도 좀 먹어야 하고 또 쉬면서 스마트폰도 충전을 해야 하니 나로서는 대피소에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게 몇 번이고 목청껏 사람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뉘시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법계사 방향에서 스님 한분이 나를 보며 말을 건넨다.
“스님! 여기 대피소에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
마치 생전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는 듯 되물은 스님이 조심스레 내 쪽으로 다가온다.
“스님 혹시 여기 대피소에서 누가 난동이라도 피웠습니까?
어째 계단이고 난간이고 망가져 있네요.
더구나 바닥에는 핏자국 같은 것도 있고.”
내 말에 스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어찌 예까지 올라 왔는지?
소식을 전혀 모르는 거요?”
대뜸 하는 말이 왜 왔냐는 투다.
기분이 살짝 상했다.
그렇다고 그런 티를 낼 정도는 물론 아니다.
“소식이라뇨?
혹시 블랙크리스탈 조각이라도 떨어졌습니까?”
“블랙크리스탈은 알고 있구만.”
“정말 블랙크리스탈이 떨어진 겁니까?
지난달 20일 새벽에 블랙크리스탈이 파괴됐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요.”
“그 소식도 알고 있고.”
“흠,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연세도 지긋하신 스님이 젊은 사람을 두고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다.
자연 나 역시 말이 퉁명스럽다.
“어디 있다 왔는지 모르나 그 후로 세상이 망조가 든 건 모르는구만.”
“예? 망조요?”
“일단 따라오시오.”
법계사 방향이다.
“그런데 절은 왜 저런 모습입니까? 일주문 주변 청소도 하지 않고.”
답없는 스님을 놀리려고 산문 청소도 않느냐며 비아냥거렸다.
“후, 그러게 말이오.”
그렇게 말하는 스님의 음성은 정말 세상 다 산 거 같은 목소리다.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뒤를 따르며 별별 상상이 떠오른다.
중과 보살의 치정?
아니면 대피소 사장님 부인과 중의 치정?
매일 쏟아지던 뉴스의 영향인지 떠오르는 생각이 주로 그런 쪽이다.
법계사는 그리 크지 않은 절이다.
하긴 해발 1,400m 산비탈에 지은 절이니 크게 짓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밥은 먹었소?”
“아침은 먹었습니다.”
“어디에 있다 소식도 모르는 거요?”
“천왕봉에 있었습니다만.”
“아니. 이 눈 속에?”
놀랐는지 돌아서 한 동안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정말이구만.
내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왕봉 쪽으로는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던데?”
놀라는 모습을 보니 좀 전과는 달리 영락없는 시골노인이다.
“예, 제 키보다 높게 쌓였습니다.”
“허! 여기에 온 눈은 눈도 아니었구만. 용케 죽지 않고 예까지 내려왔소이다, 그려.”
경내에 들어서니 내 또래의 젊은 스님 하나가 다가온다.
“일우야! 여기 시주 분 공양 좀 준비해 드리거라.
일단 공양을 하시고 말씀 나눕시다.”
별말 없는 젊은 승려를 따르는데 그래도 유명하다면 유명한 사찰인데도 보살님 한분 안 보인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말없이 젊은 승려를 따라가 준비해주는 공양을 받았다.
공양도 관광지의 사찰치곤 정말 부실하다.
지난 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김치에 두부조림이 전부다.
사찰이면 흔하디흔한 무나물 하나 없다.
그래도 김치 맛이 좋아선지 맛있게 한 그릇을 비웠다.
“모시라고 하십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라가니 대웅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사채로 향한다.
“앉으시오.”
요사채라고 해서 단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다.
TV도 있고 컴퓨터에 유선전화까지.
있을 건 다 있는 보통 가정집 같은 풍경이다.
“커피 한잔 하시겠소?”
“주시면 감사합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신 스님은 먼저 나에 대해 물었다.
“시주께서는 어쩌다 산에서 한달이나 계시게 된 거요?
내 말은 조난인지 아닌지 묻는 거요?”
“조난은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대단하시오.
이 폭설에 천왕봉에서 혼자 계셨다니 신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오.
더구나 영향도 받은 거 같지 않고.”
“영향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 전에 이 전화기 충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구려.”
다행히 스님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같은 제품이라 충전기는 맞았다.
“일단 지난 달 20일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아시겠지만 지난달 20일 새벽 모든 이들의 염원 덕인지 그 블랙크리스탈이 파괴가 되었지.
다들 기쁨에 들떴고.
그래도 아직은 자정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말도 있어 애써 기쁨을 감추고 있었어요.
수양이 부족했는지 잠도 오지 않더군.
자정이 되면서 눈이 온다는 말에 서설이구나 하고 좋아라 했지.
이미 일기예보에 눈이 약간 온다는 말이 있었기도 했고.
그런데 눈이 정말 엄청 오더군.
평생 그렇게 많은 눈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
오다 그쳤다 하는 눈을 치우느라 여기 중들뿐 아니라 요사채에 머물던 시주들까지 동원돼야 했을 정도니까.
보살님들도 고생이 많았지.
눈이 내리니 집에도 못 가고 눈만 치웠거든.
절에 있던 시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다들 우리 절에 있는 걸 고맙게 생각들 했어.
나중에 전화기 충전돼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난리도 아니었거든.”
“예? 난리요?”
“그건 내 얘기보다 나중에 뉴스 검색을 하시면 잘 알 수 있을 게요.
그러니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고.
아무튼 모두가 노력한 덕에 오일 째는 아래로 길을 낼 수가 있었어.”
눈을 치우느라 고생한 시주와 보살들은 26일 아침 공양 후 내려가기로 했다.
문제는 26일 아침 아프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스님 하나에 시주 하나다.
거기다 다른 이들을 배웅하느라 대피소까지 내려가니 대피소에도 등산객 하나가 아프다고 해 절로 옮겼다.
아무래도 대피소보다는 절이 여러모로 좋다는 판단이었다.
처음에는 눈을 치우느라 몸살이 난 거라고 여겼다.
당연 쉬다 내려가라고 했고 아궁이에 땔감을 밀어넣었다.
그런데 다음날 그들 모두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난리다.
급히 산청 소방서에 연락을 했지만 당장은 힘들다는 답만 돌아왔다.
들어보니 지난 1년 경찰이나 소방 모두 업무강도가 극한이었단다.
거기에 블랙크리스탈의 잔해로 인한 피해가 한국을 피해간 것도 아니었다.
한국 땅에도 자잘한 운석이 떨어져 여기저기 화재도 나고 사람도 다치고 해 군경과 소방 모두 눈코뜰 새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실 환자의 증세도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사실 숨을 쉬기 힘들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도 힘들고.
그리고 평소 천식이 있지 않는 한 갑자기 위험하게 되지도 않는다.
높은 곳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다.
또 그러다 마는 이들도 주위에서 종종 보기도 했다.
결국 스님들이 아픈 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물론 특별히 보살필 것도 없다.
매일 먹는 공양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고 머무는 방에 땔감이나 듬뿍 밀어 넣는 정도다.
두 환자에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렇지만 눈 쌓인 겨울산이다.
가족이 예까지 오르다간 가족까지 병이 날 수도 있다.
결국 환자들 모두 아랫동네도 난리라며 좀 더 쉬다 내려가기로 한 모양이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연말이 가깝다.
이제는 업고라도 산 아래로 옮기자는 얘기를 하는 중 바로 그날 다시 한번 눈이 오면서 그것도 쉽지 않게 됐다.
눈을 치웠어도 위험한 길인데 다시 눈이 내렸으니 성한 사람도 조심스러운 길인 것이다.
더구나 건장한 중년의 남자들이다.
보기에 80kg는 됨직한 몸들이다.
자칫 환자를 옮기다가 여럿이 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더 기다리기로 했다.
최소한 눈이 완전히 녹기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중 숨쉬기가 힘들다던 스님이 고통에 겨웠는지 잠만 자기 시작했다.
하루 온 종일.
다음날은 의식도 없다.
죽은 건 아니다.
다른 두 사람은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숨쉬기가 힘들단다.
소방서에 소리를 좀 쳤더니 그제야 세 사람이 왔는데 와서 보고는 잠만 자는 스님이 위험할 수 있다며 스님만 산 아래로 옮기겠단다.
물론 고통을 호소하는 다른 두 사람이 소방서 직원에게 호소를 했지만 당장은 어쩔 수가 없다는 답만 들었다.
헬기라도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한 후 배웅할 수밖에.
그리고 다음날 그 두 사람 중 본래부터 절에 머물던 시주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1월 1일 새해 벽두였다.
읽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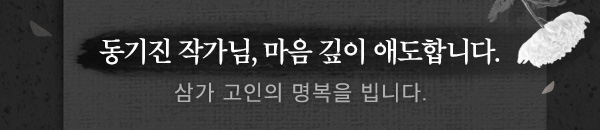



![회귀가 뭐 이래 [D] 회귀가 뭐 이래 [D]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0827/002/0fdZDthA88jDEmV1.jpgtb.jpg)

![재벌집 둘째 딸 [E] 재벌집 둘째 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1016/004/LvLoJbQfIaPkuuux.jpgtb.jpg)
![무적명 [E] 무적명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22/004/Q3NrY5L4gBomWliR.jpgtb.jpg)
![[개정판] 절대강호 [E] [개정판] 절대강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0/L21c6WTac8xjIMV9.jpgtb.jpg)
![천하제일 [E] 천하제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208/000/awfcpckFeudjf6fl.jpgtb.jpg)
![환생천마 [E] 환생천마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811/003/WumOfA2Xi4kdQgsM.jpgtb.jpg)
![십왕연대기 [E] 십왕연대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724/003/sl0KdDMPOMATYNyA.jpgtb.jpg)
![[개정판] 절대군림 [E] [개정판] 절대군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1/1228/004/83cEWLBuUh91wQMN.jpgtb.jpg)
![소환수 레벨 업! [E] 소환수 레벨 업!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22/0607/000/CSr8hpaqQDkBCdAF.jpgtb.jpg)
![마신의 검 [E] 마신의 검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0307/000/ZAMQzYaRN3D0Jddp.jpgtb.jpg)
![생기왕 [E] 생기왕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118/000/2HCxkWPPlgglXoYR.jpgtb.jpg)
![배구 마에스트로 [E] 배구 마에스트로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424/004/9u1L7C4h3JYfkpsg.jpgtb.jpg)
![전지적 관중 시점 [E] 전지적 관중 시점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425/001/IsTdxBSzbOcG7S80.jpgtb.jpg)
![현질해서 톱스타! [E] 현질해서 톱스타!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926/002/v78M2gGNIBU8a3X8.jpgtb.jpg)
![4차원의 헌터 [E] 4차원의 헌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9/003/zVl5OrYfcUz2P9Np.jpgtb.jpg)
![재벌 야망 [E] 재벌 야망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1120/004/CdoA7buIIan0CHjg.jpgtb.jpg)
![탤런트 스토어 [E] 탤런트 스토어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9/0906/001/vSZrca7a4n8mTgqb.jpgtb.jpg)
![골든 메이지 [E] 골든 메이지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814/002/eKq3iVnJJSqfs7PE.jpgtb.jpg)
![척안의 마도사 [E] 척안의 마도사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918/001/o4s9pDChKGlt0zTE.jpgtb.jpg)
![헬릭스 [E] 헬릭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1212/001/X3ORJCHCUeq8yzF4.jpgtb.jpg)
![천신 [E] 천신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1205/003/g0STdpPownKi6ERM.jpgtb.jpg)
![타나토스 [E] 타나토스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1012/004/0iSpWJgY57a8h7Za.jpgtb.jpg)
![동국기 [E] 동국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7/0307/001/mAkn47theA2nUa19.jpgtb.jpg)
![천애지각 [E] 천애지각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6/1010/001/VGtdp6ZggpGG6JLx.jpgtb.jpg)
![재벌강점기 [E] 재벌강점기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508/004/aIBJ9u9YXsD5eLZy.jpgtb.jpg)
![메탈 브레인 [E] 메탈 브레인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8/0619/001/oIEuptOlNeeDZG30.jpgtb.jpg)
![장홍관일 [E] 장홍관일 [E]의 표지](http://cdn1.munpia.com/files/attach/2014/1210/001/yJCj1VYfOhRn2t8a.jpgtb.jpg)

Comment ' 1